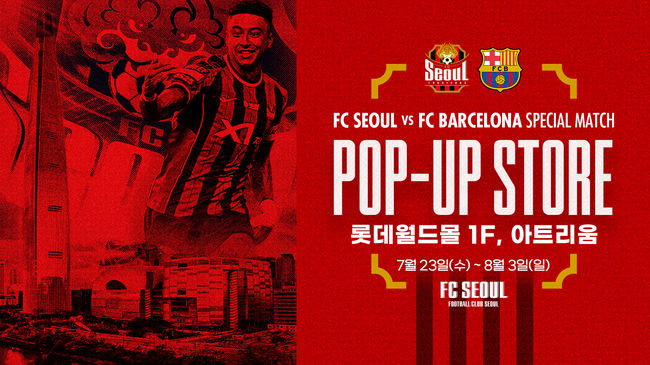K팝과 무속을 결합해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사진=넷플릭스)

하지만 문화 콘텐츠를 들여다 보며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뇌 기능 같은 의학적인 문제보다 더 관심이 가는 건 이러한 초지능 사회가 불러올 인간의 감정에 대한 변화다. 빅데이터를 순식간에 끌어와 분석하고 정리해 주는 AI가 만들어내는 초효율은 자칫 좌뇌의 기능에만 빠져 있는 사회의 경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다. 하지만 예술은 그런 데이터 분석과 정리만으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결국 인간만이 가진 ‘감정’을 건드리고 그걸 끄집어내 때론 울리고 웃기는 카타르시스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술이 아니라 그저 수치에 불과한 데이터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내에 AI가 야기할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을 촉발시킨 사건으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얘기하곤 한다. 2016년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바둑 AI 프로그램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 맞붙어 4승 1패를 기록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읽어야 하는 바둑의 특성상 빠른 학습을 통해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그것도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알파고의 능력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결 이후 AI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급증했다. 특히 이세돌 9단의 패배로 우리가 주목했던 건 AI의 등장으로 사라질 직업과 새롭게 생겨날 직업 같은 보다 현실적인 것들이었다. 단순 반복 업무들은 사라질 것이고 대신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할 거라는 예측이 쏟아졌다. 그나마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인간의 창의적인 작업은 AI가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그림을 그리거나 에세이를 쓰는 데도 AI를 활용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그런데 AI가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 이 시대에 최근 이 초지능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보이는 ‘무속’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떠오르는 현상이 눈에 띈다. K팝과 무속을 결합해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나 극장의 관객수가 급감하는 요즘 작년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넘겨버린 ‘파묘’, 또 올해만 해도 ‘귀궁’, ‘견우와 선녀’ 같은 무당이 주인공인 드라마들이 연달아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 현상이 그것이다. 심지어 무당은 ‘신들린 연애’ 같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등장했다. 과거 ‘전설의 고향’에나 등장할 법한 어딘가 어두운 분위기의 무당 이미지는 최근 들어 훨씬 발랄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 무당’으로 대치되고 있는 중이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때문에 젊은 세대가 무당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내가 보기에 최근 무당이 급부상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AI로 대변되는 초지능 사회가 불러온 무감정의 차가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닐까 싶다. 무당만큼 ‘감정’을 다루는 존재가 또 있을까. 누군가의 한이나 슬픔, 상처 같은 감정들을 초자연적인 대상처럼 다루고 어루만져 가야 할 곳으로 보내고 남은 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들의 역할이다. 악령을 퇴치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서구의 구마 사제와는 사뭇 다른 역할로, 최근 서구에서도 무당이 주목받는 이유다.
사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두고두고 명승부로 회자하는 건 몇 대 몇으로 승패가 갈렸는가 하는 결과론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 1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이세돌이 느꼈을 인간적 고뇌와 감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바둑 대결 그 자체보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 대결을 하는 이들이 마주한 감정이 아닐까 싶다. 이를 잘 보여준 작품이 조훈현과 그의 제자 이창호의 사제대결을 소재로 한 영화 ‘승부’다. 이 작품은 바둑을 전혀 모르는 이들도 빠져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대결 그 자체보다 스승이었던 조훈현이 느꼈을 열패감과 당혹감이나 이창호가 갖게 된 승부욕과 미안함 같은 감정들이 관객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기 때문이다.
AI는 바로 이 바둑판 같은 세계가 아닐까 싶다. 무수한 경우의 수가 데이터로 쌓여 승부에 있어 분명하게 어떤 결과를 내놓는 그런 세계. 하지만 그런 세계는 승부를 낼 수는 있어도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고 나아가 변화시키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더 빨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바둑판이 제공되는 시대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바둑을 두는 사람의 감정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다. 초지능을 구현하는 AI 시대에 초감정을 다루는 무속이 뜨는 현상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