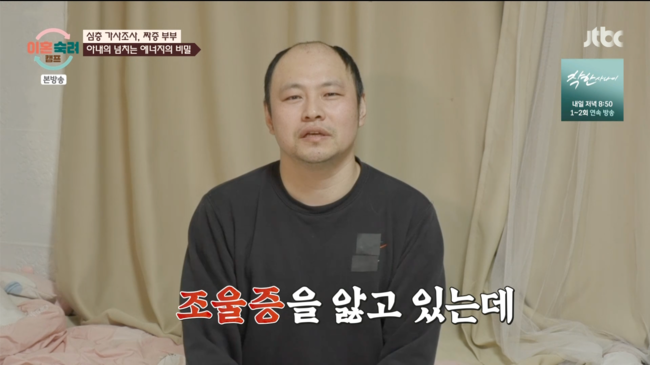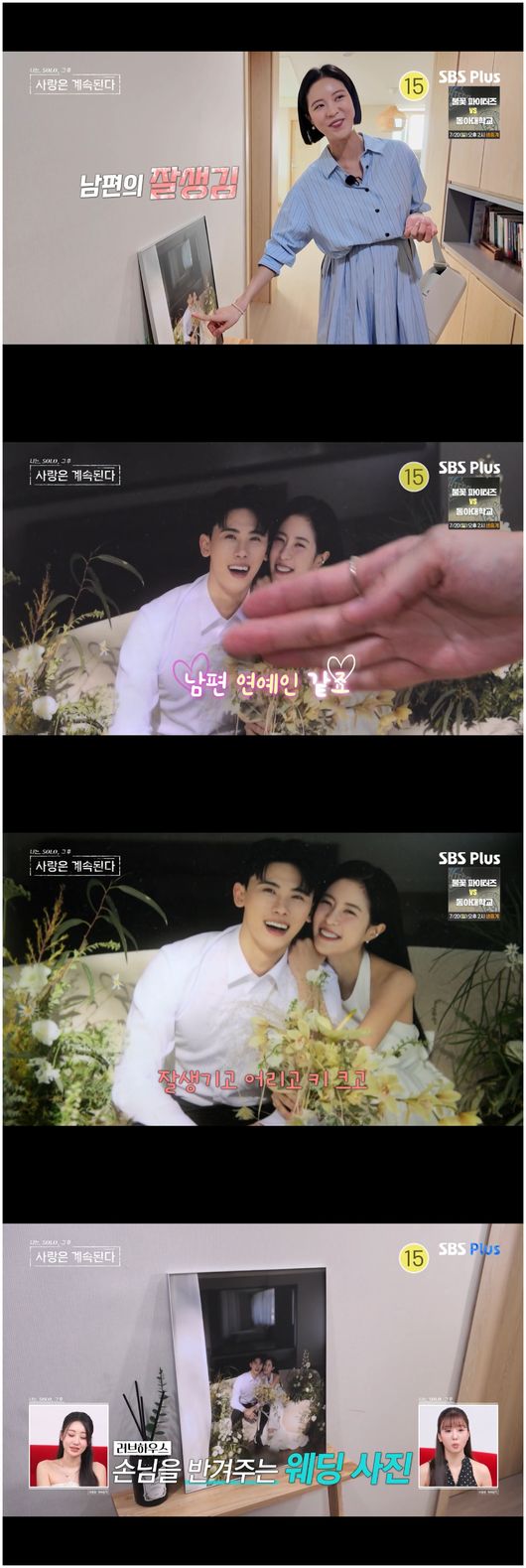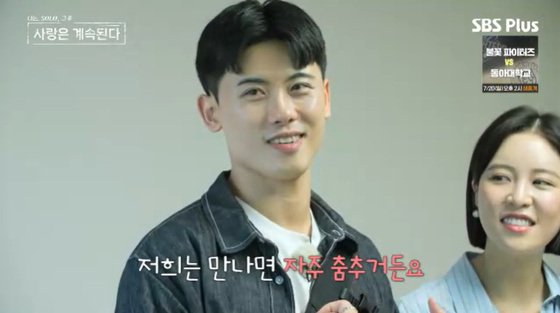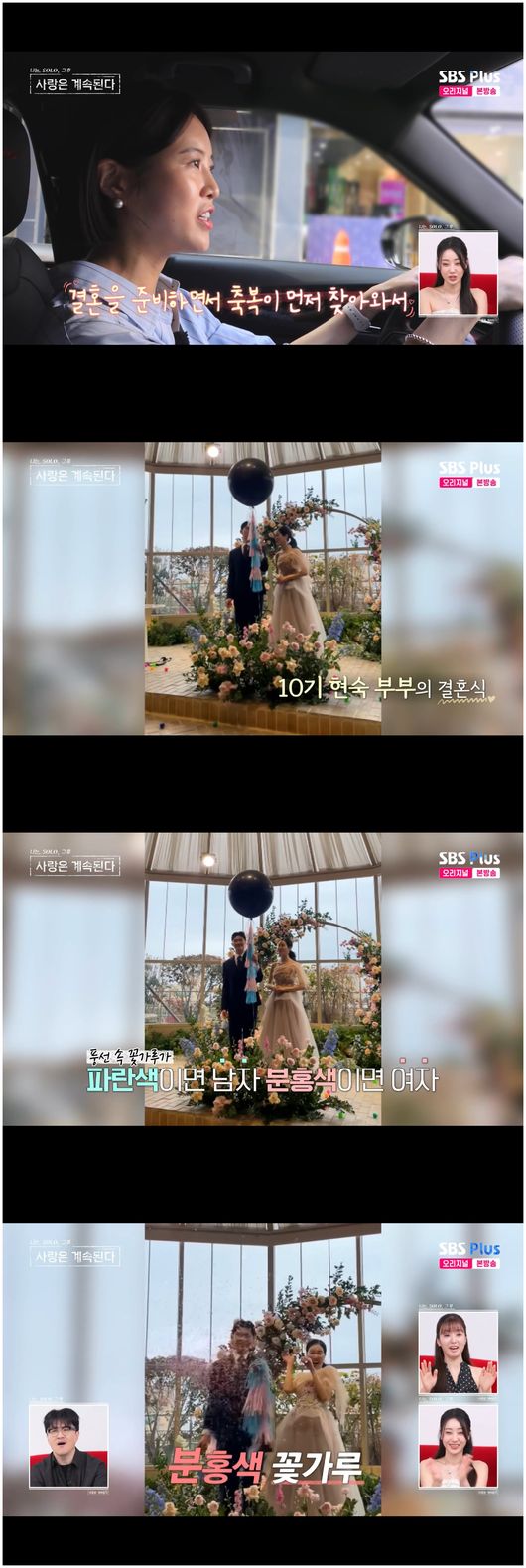서이초 교사가 일했던 교실에 추모 꽃다발이 놓여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고,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5법'이 제정됐으나 교사 10명 중 8명이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의 79.3%(3254명)가 교권5법 시행에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스승의날 설문조사 동일 문항에서의 부정응답(73.4%)보다 5.9% 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변화를 느끼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교원의 61.7%가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을 꼽았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에 대한 불안(45.1%) △학생·학부모의 부족한인식 변화·실천(41.4%) △여전한 민원 발생과 민원 처리의 어려움(40.5%) 등이 뒤를 이었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교권 침해가 빈번하다는 게 교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실제로 교총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체 교원의 48.3%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
하지만 실제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신고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발생 우려(70.0%) △낮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처분 효과 기대(51.4%) 등이 꼽혔다.
교사들은 도입된 제도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권5법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분리할 권한이 생겼으나, 실제로 조치를 한 교원은 2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42.6%는 분리를 원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등 학생·학부모의 반발과 민원 우려(67.7%) △분리를 위한 공간·인력·프로그램 부재(32.7%)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3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지만, 교원의 77.6%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현행 학교 민원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거르고, 교원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87.9%로 집계됐다.

'제주교사 추모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교사의 동료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개선 방안으로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5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45.5%) 순이었다.
또 교원 91.1%가 악성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창구를 학교 대표전화나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교원의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청 단위의 통합 민원대응팀 구성과 법률지원 강화'(27.5%), '민원 대응 전담팀 학교 배치'(22.5%)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선 응답자 중 34.4%가 교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담되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전 대책 마련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은 23.3%였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98.9%로 조사됐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교권 추락의 참담한 성적표'라고 평가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과도한 업무'였던 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2024년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바뀌었다.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는 '교육의 가치 격하'에서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신'으로 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