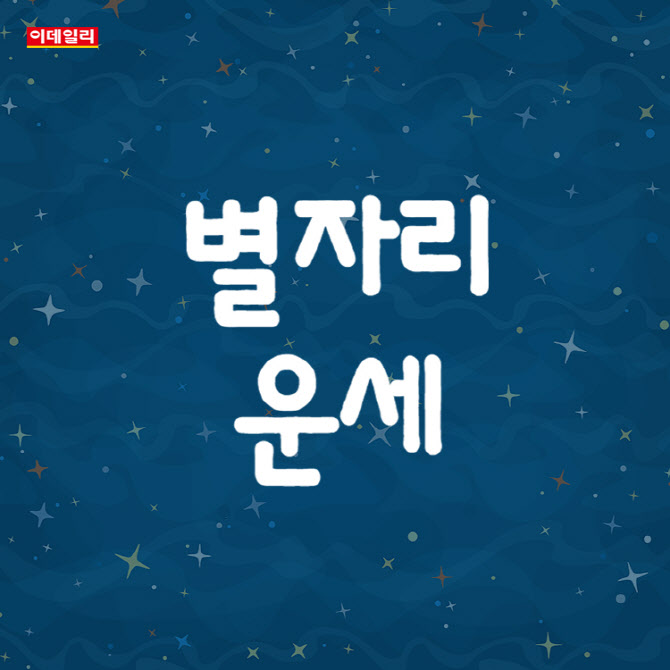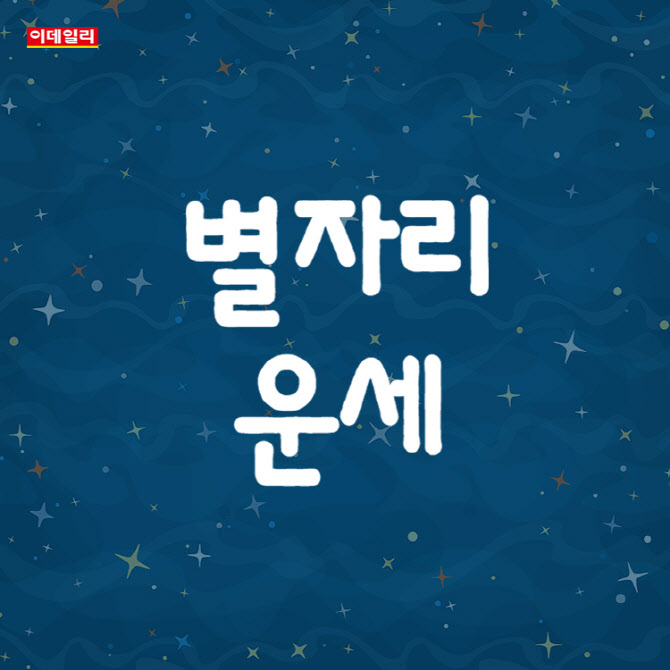‘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가 지난 10월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악가 고(故) 안영재(30)씨를 추모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중대재해전문가넷)
관객에게는 주로 연주자의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만 보여진다. 관객들은 그 연주자가 무대 위에 서기까지 쓴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 공연을 그 해당 일에 세우기 위해 흘리는 연주자와 스태프들의 땀과 눈물 등등을 직접 체감하기 다소 어렵다. 세상의 모든 면이 그렇듯이 명암(明暗)에서 명(明)은 눈에 잘 띄지만, 암(暗)은 일부러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월 21일 성악가 故 안영재 씨가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그의 나이 불과 서른. 그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의 한 오페라 무대 리허설 중 사고를 당한 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장기간 투병 중이었다. 하지만 산재보험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억대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상해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당한 사고도 아니다. 명백히 무대 위에서 리허설 중 벌어진 사고인데도,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다니. 너무 어불성설 아닌가. 엄밀히 현행법상 인정되기 힘들다 해도 아쉬운 점이 많다. 세종문화회관은 도의적 책임으로라도 안영재 성악가가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가 의문이다. 적절한 의료지원이 제때 이루어졌으면 한 명의 운명이 달라졌을까?
오히려 세종문화회관의 해명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당시 세종문화회관 측은 “무대 장치가 예정된 동선을 따라 하강하던 중 출연자가 들고 있던 소품에 장치가 닿았다”며 “사고 직후 출연자는 스스로 무대를 걸어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마치 은연 중에 안영재 씨가 있으면 안 될 곳에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 척수 쪽 손상은 근육이나 뼈의 부상과는 매우 다른 매커니즘을 보인다. 신경계란 것이 충격이 가해진 후 바로 무력화되는 때도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서서히 조직이 망가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안영재 씨가 사망하기 전 매스컴이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뤘다면 세종문화회관과 용역업체가 책임회피를 그만하고 부상자의 처우에 집중했을까? 어찌 됐든 매우 안타깝게도 세종문화회관은 사고 당시에도, 이후에도, 심지어 이 젊고 전도유망한 성악가가 결국 사망한 후에도 제대로 된 향후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미 사후약방문이 되었다. 안영재 씨 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예술인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청중은 예술인들이 화려한 직업으로 알고 있지만, 예술인들 또한 노동자일 뿐이다. 공연 당일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그 무대 위에 올라가기까지 피나는 노력과 셀 수 없는 시간이 잘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일반 노동자들처럼 예술인들도 고뇌하고 땀을 흘린다. 리가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를 떠올리면 먼저 무얼 기억하는가. 그들의 재력도 군사력도 아닌, 그들의 문화다. 한 나라가 평가를 받는 잣대는 바로 그 나라의 문화적 역량이다. K-문화강국을 외치는 요즘, 몇몇 분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술인들, 나아가 예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진정으로 국민주권정부로 평가받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