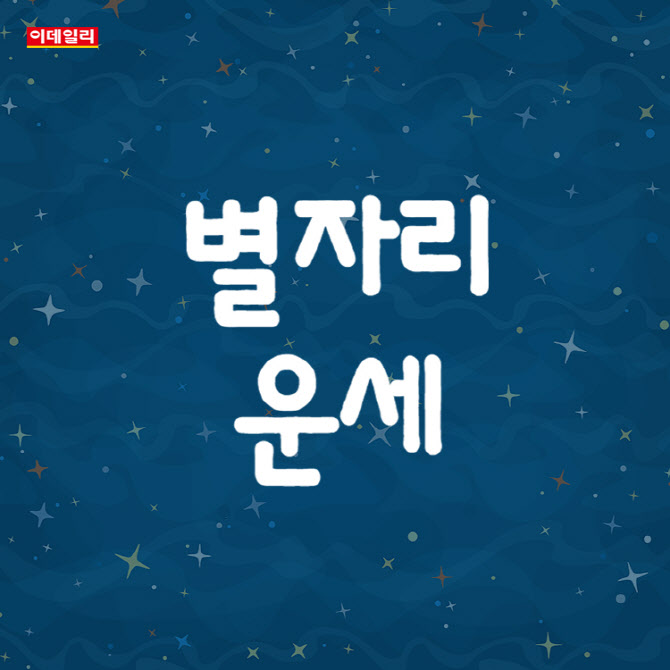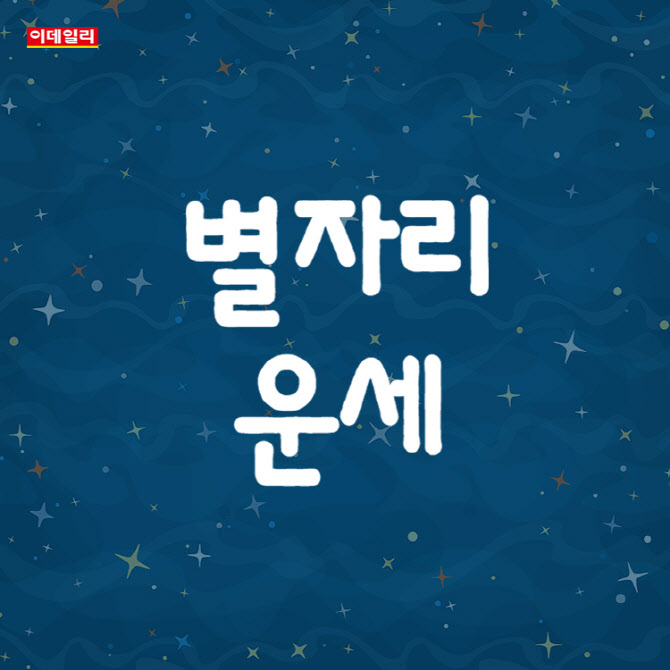(오른쪽부터)이화여대의 김진원 연구교수, 김지은 학부생, 허창회 석좌교수, 서울대 유승우 대학원생. (사진=이화여대)
또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한 해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낮았던 해는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엘니뇨 현상만으로는 우리나라 겨울 기온의 변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상층 제트기류(−0.80) △시베리아 고기압(−0.70)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0.65) △북극진동(0.42) 등 다른 기후 요인들은 겨울철 기온과 훨씬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엘니뇨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우리나라 기온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여름철 태풍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한 해에 우리나라 태풍 상륙과 발생 횟수, 태풍 진로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계절평균 강수량도 엘니뇨보다는 상층 제트기류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와 강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엘니뇨 위주의 단순 예측보다는 열대와 중위도 기후 요인을 모두 반영한 통합적 기후 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열대 태평양은 우리나라에서 1만k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영향은 간접적”이라며 “우리나라는 면적이 작고 열대와 중위도 기상현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일 요인인 엘니뇨로 기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