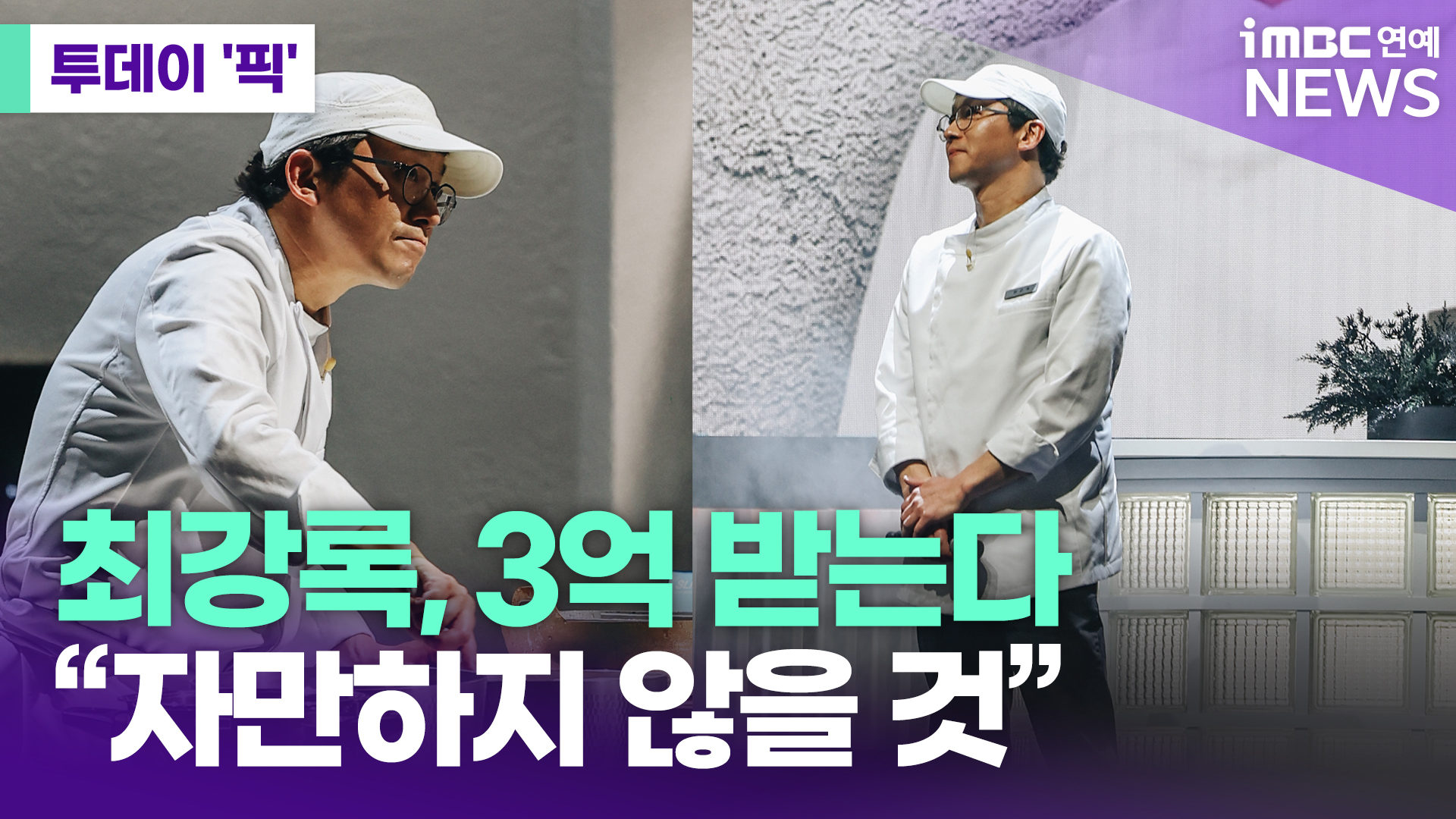김 모씨는 새해를 맞아 안산에 살고 있는 70대 모친 집을 찾았다가 집안을 메운 잡동사니들에 한숨이 나왔다. 홍보관에서 샀거나 ‘미끼상품’으로 받은 전기매트, 두루마리 휴지와 주방세제 등이 거실에 쌓여 있었다. 자녀들이 살다 떠난 빈 방도 홍보관 물건들로 채워졌다. 김씨는 “홍보관 좀 그만 가시라고 말리면 엄마는 ‘심심한데 갈 데도 없고 어떡하느냐’고 해 매번 말문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 늘면서 2045년이면 전체 1인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1%까지 늘어난다. 1인가구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개인 차원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도 적절한 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단 평가가 많다. 취약계층 위주의 1인가구 지원에서 나아가 다양해진 1인가구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복지와 여가, 돌봄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 기초연금 도입에 자살률↓…경제지원 절실

(사진=연합뉴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노인가구는 2006년 24만 2470가구에서 2024년 56만 3540가구로 두 배 이상 늘며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을 우선 지원하겠단 취지가 깔려 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고령층 자살률이 눈에 띄게 개선된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지원은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다만 연금 등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1인 노인 가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돌봄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경제력이 있더라도 외로움은 별개의 문제다. 김씨의 모친처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모아둔 돈을 허투루 쓰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경제력이 있는 노인 가구에게 절실한 건 사회적 교류 확대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독거 기간이 길어진 노인들을 위한 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두터워져야 하지만, 보편적인 1인 노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고 짚었다.
◇ 일반적 1인 가구엔 ‘교류·여가’ 공간 늘어야
1인 노인 가구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선 물리적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고령층은 SNS를 통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량을 늘리는 차원에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인가구 증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 내에 1인가구가 부담없이 방문해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보교류, 상호 부조,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는 생활 밀착형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했다. 공유 부엌과 작은 음악실 같은 공유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더욱 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네 노인정, 경로당 공간의 재설계 요구도 동시에 나온다.
최 교수는 “노인정은 텃세가 있다는 둥 늙은 분들이 가서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둥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이 있다”고 한 뒤, “예전엔 나이 들면 병원 근처에 살라고 했지만 요새는 노인복지관 근처에서 살라고들 한다. 저비용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강점 큰 서비스”라며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두텁게 하는 동시에 배타적인 공간이 된 경로당은 열린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1인 노인 가구가 늘고 요구도 다양화해져, 그에 따른 촘촘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교수는 “일할 수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 병든 노인과 건강한 노인 등 1인 가구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융통성을 갖고 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