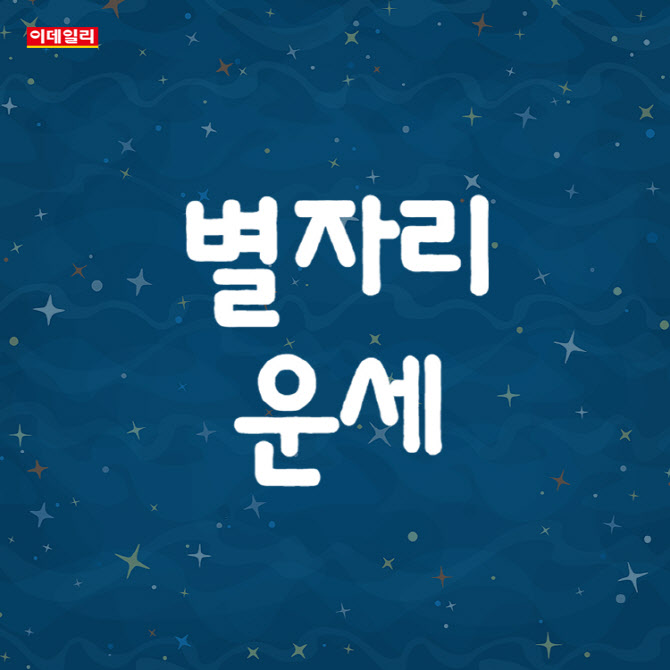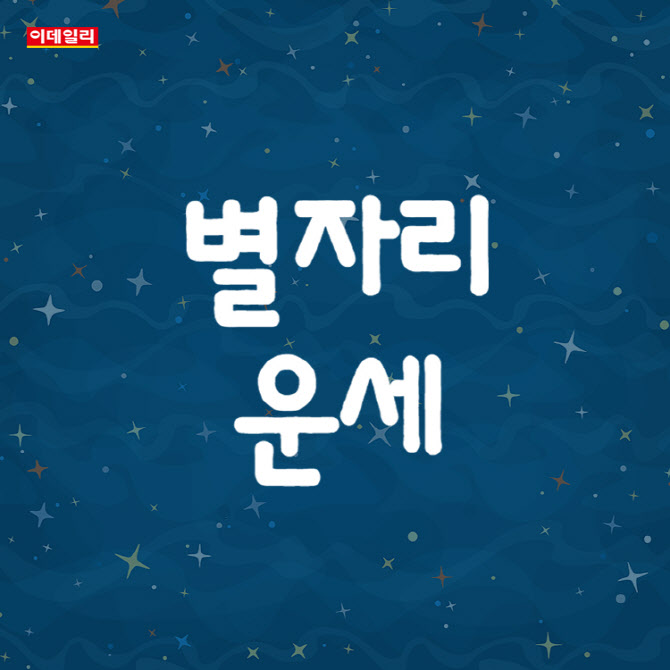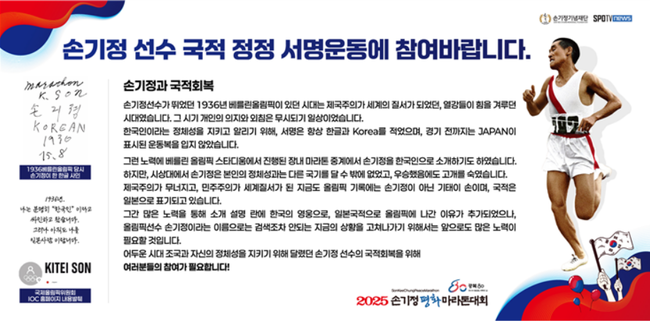그러나 증권사들이 원금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상,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발행어음 도입 이후 수년이 지났어도 모험자본 공급 효과가 미미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험투자 비중 점검과 인센티브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인가를 신청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면 공식적으로 IMA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에 신청서를 냈던 미래에셋·한투와 달리 9월 말에 접수한 NH투자증권은 심사 일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추가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에 대해서도 키움증권을 대상자로 정했다. 접수가 늦은 다른 참가사인 삼성·신한·메리츠·하나증권에 대한 심사는 진행 중이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내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IMA 제도를 도입했다. 발행어음에 이어 장기 조달 수단을 허용해 기업금융 자금을 늘리고, 스타트업·벤처 등 혁신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발행어음 제도 도입 당시에도 모험자본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발행어음 제도 도입의 취지는 기업금융 확대와 혁신산업 지원이었지만, 실제 운용 자금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 대출과 단기채권, 부동산 자산 등에 머물렀다. 원금보장 구조와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이 발행어음 자금을 고위험 투자로 연결시키는 데 제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원금보장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IMA 조달액의 25%를 스타트업·벤처 등 혁신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지만, 원금보장 구조상 위험 자산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기는 쉽지 않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이 증권사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은 수익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 회사채나 중견기업 대출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위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국내 증권사의 모험자본 운용 역량은 아직 제한적이다. 그동안 기업금융 부문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돼 왔고, IT와 AI 등 기술기업·초기 벤처에 대한 심사·관리 인프라는 미흡하다. 금융당국이 PF 비중을 10%로 축소하고 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해도, 실제 자금이 벤처로 유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IMA가 자금조달 수단으로만 활용되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제도 취지는 퇴색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IMA 운용자산의 모험투자 비중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한 증권사에 대해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