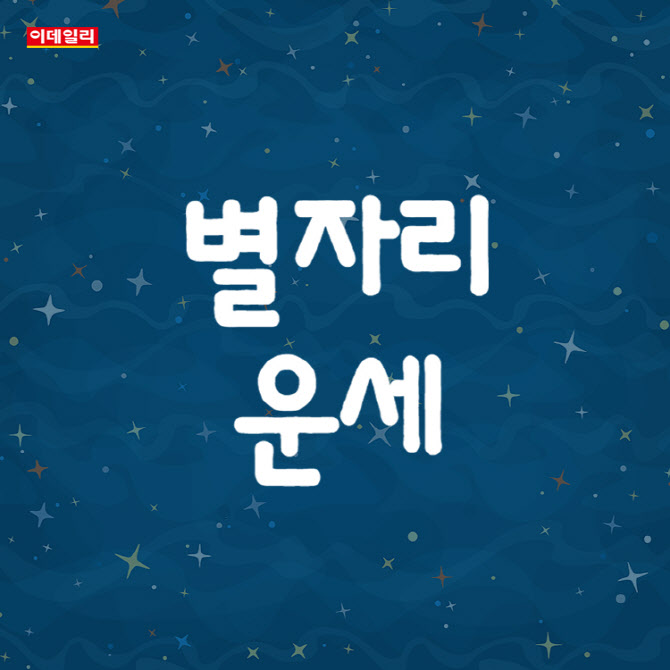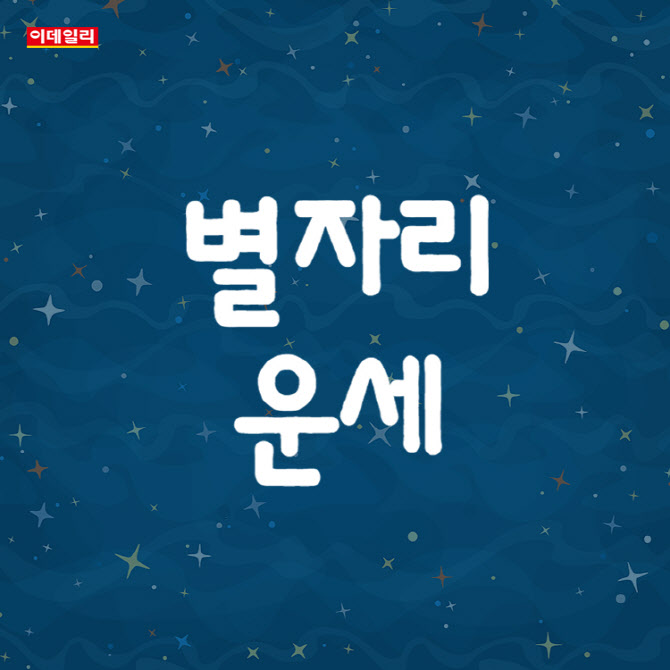미국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2025년 7월 ‘AI 행동 계획’을 발표해 AI 기반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반도체 및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안을 강화한 데이터센터 구축 등 대응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이 ‘동수서산’(東數西算) 즉, 산업 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의 데이터를 전력과 토지 등 자원이 풍부한 서부 지역으로 전송해 연산·저장·처리 등을 분산하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나선 데 따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아마존(1000억 달러 투입), 알파벳(7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800억 달러)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및 인프라 선도에 맞선 유럽연합(EU)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EU는 2024년 8월 ‘AI 액트’(AI 법)를 통해 전 세계 AI 규제 기준을 설정한 최초의 포괄적 법안을 발효했다. 이 법안은 △허용불가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4단계의 AI 차등 규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 프레임워크 구축과 함께 AI 기술의 컴플라이언스 촉진을 규정화하고 있다. 앞으로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4단계 규제의 부담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AI 3대 강국에 도전하는 우리의 ‘AI 전환’(AI Transformation·AX) 전략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산업 맞춤형 버티컬 AI를 통한 제조·헬스케어·스마트시트 등 우리만의 강점을 살린 AI 솔루션 개발은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AI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고 EU AI 법 등 국제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강화 전략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다만 힘겨운 3대 강국보다는 실속 있는 5대 강국 전략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