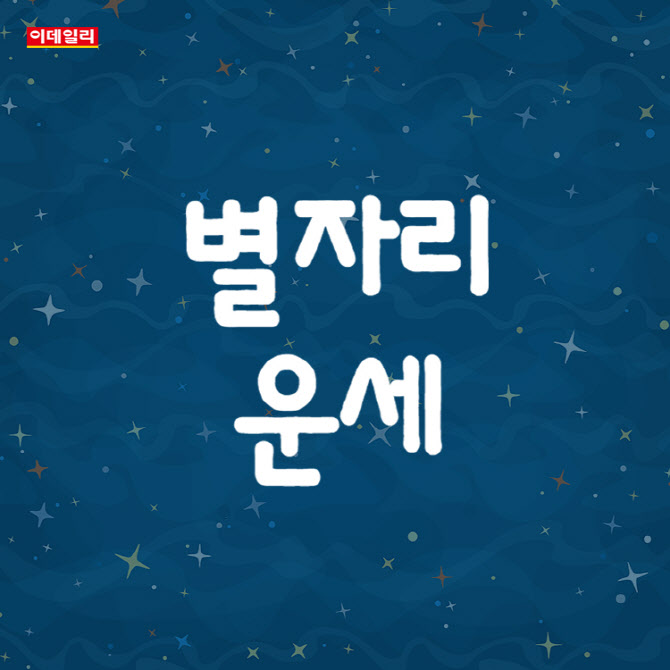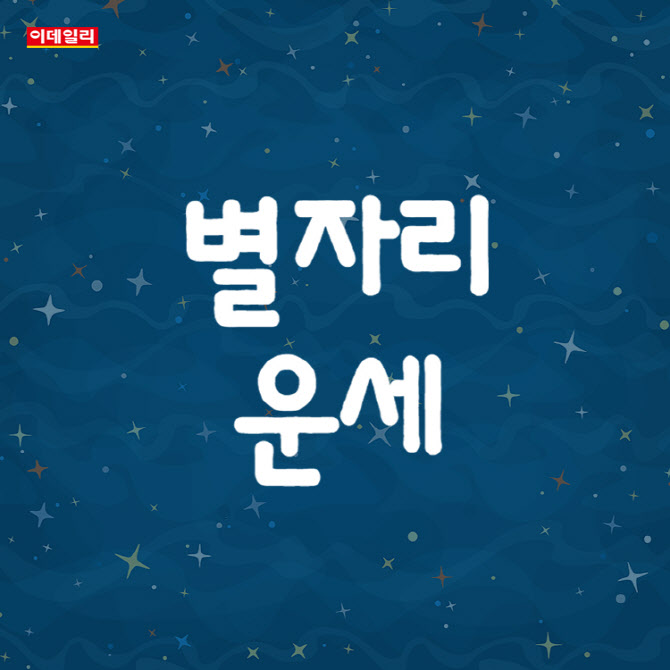리사 쿠 연방준비제도 이사(사진=AFP)
쿡 이사는 “스트레스가 없는 시기에는 이러한 방식의 거래가 국채 및 관련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개선한다”면서도 “스트레스 국면에서는 이러한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될 경우 시장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헤지펀드가 국채 시장에서 차지하는 과도한 비중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헤지펀드들의 베이시스 트레이드 규모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달 발표된 연준 연구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케이맨 제도 기반 헤지펀드들이 매입한 미국 국채 물량은 다른 모든 해외 민간 보유 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케이맨 제도는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 중 한 곳으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법인 등록지로 선호하고 있다.
쿡 이사는 헤지펀드의 미 국채 현물 보유 비중이 올해 1분기 10.3%로 상승해, 팬데믹 이전 최고치(9.4%)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국채 현물과 선물 간 가격 차이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지만 헤지펀드들은 이 차익을 위해 막대한 차입을 동원한다.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 수익을 배가시키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과거 여러 금융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시장이 급락하자 헤지펀드들은 대규모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급히 청산했고, 이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급변하며 공포가 다른 시장으로 번졌다.
2019년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시장 위기도 있었다. 연준의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으로 시중에서 준비금이 빠져나가자 유동성이 부족해졌고, 헤지펀드들은 베이시스 트레이드 포지션을 급히 청산했다. 이는 현물 및 선물 국채의 강한 매도세로 이어졌고, 단기자금 시장이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금리가 급등했다.(가격 하락).
앞서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달 1일부터 QT를 종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