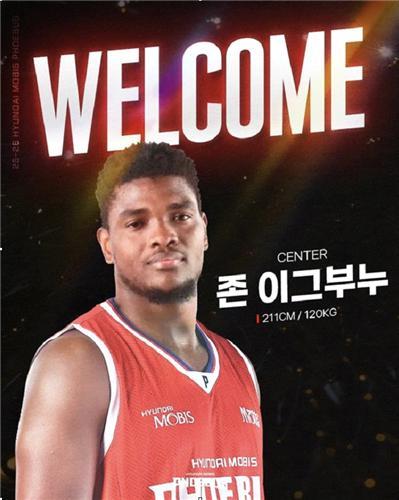통계는 말한다. 미국은 지금 ‘두 개의 소비’를 살고 있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다. 9월 실업률은 4.4%.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지갑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9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0.2%. 8월 0.6%에서 확연히 둔화했다. 자동차·휘발유를 제외하면 0.1% 증가에 그친다. 말하자면 일상 소비가 멈췄다는 뜻이다. 외식과 프리미엄 브랜드는 잘 팔린다. 반대로 의류·가정용품은 부진하다.
상층부는 자산이 계속 불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은 자산가만 기쁘게 했다. 그들에겐 비행기표 가격이 오르든, 새 휴대전화이 더 비싸지든 큰 문제가 아니다. 반면 다수의 가정은 장바구니에서 한두 개씩 물건을 빼기 시작한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치솟은 가격은 내려오지 않았고, 신용카드 연체는 늘어난다. 숫자로는 성장인데, 삶으로는 후퇴다.
미국 소비자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과 맞닿아 있다. 심리는 아래에서부터 무너진다. 이 지표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의미보다 “경기를 체감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경고음에 가깝다. 경제가 좋다는 말이 일부에게만 들리는 이유다.
최근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상위 20%가 미국 전체 소비의 57%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는 사실상 부자들의 지갑으로 굴러간다. 그들의 지갑이 닫히면, 경제도 휘청일 수 있다. 지금의 미국은 회복 중이 아니다. 상층부가 버티는 중이다.
기업들의 증언도 이를 확인한다. 월마트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소비 확대”를 말한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브랜드를 먼저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타깃도 생활·의류 부진을 인정했다. 누가 소비를 유지하고 누가 줄이는지 분명해진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다. 시장은 12월 인하 가능성을 다시 80% 이상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상층부 소비는 더 산뜻하게 회복하겠지만, 하층부의 부담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정책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위한 경기부양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직면한 질문은 간단하다. 이 경제는 누구의 경제인가.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다. 그러나 부유한 미국과 버티는 미국이 서로 등을 돌린다면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
경제는 사람의 삶이다. 삶이 갈라지면 정치도 흔들린다. 최근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 세계 자본의 심장인 뉴욕에서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한 그가 내세운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감당 가능한 수준(Affordability). “살 만하게 해달라”가 민심을 움직였다. 정치적 균열은 언제나 생활의 균열에서 싹튼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묻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경제인가, 아니면 이미 둘이 됐는가?” 그 질문에 아직 미국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갈라진 선은 더 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