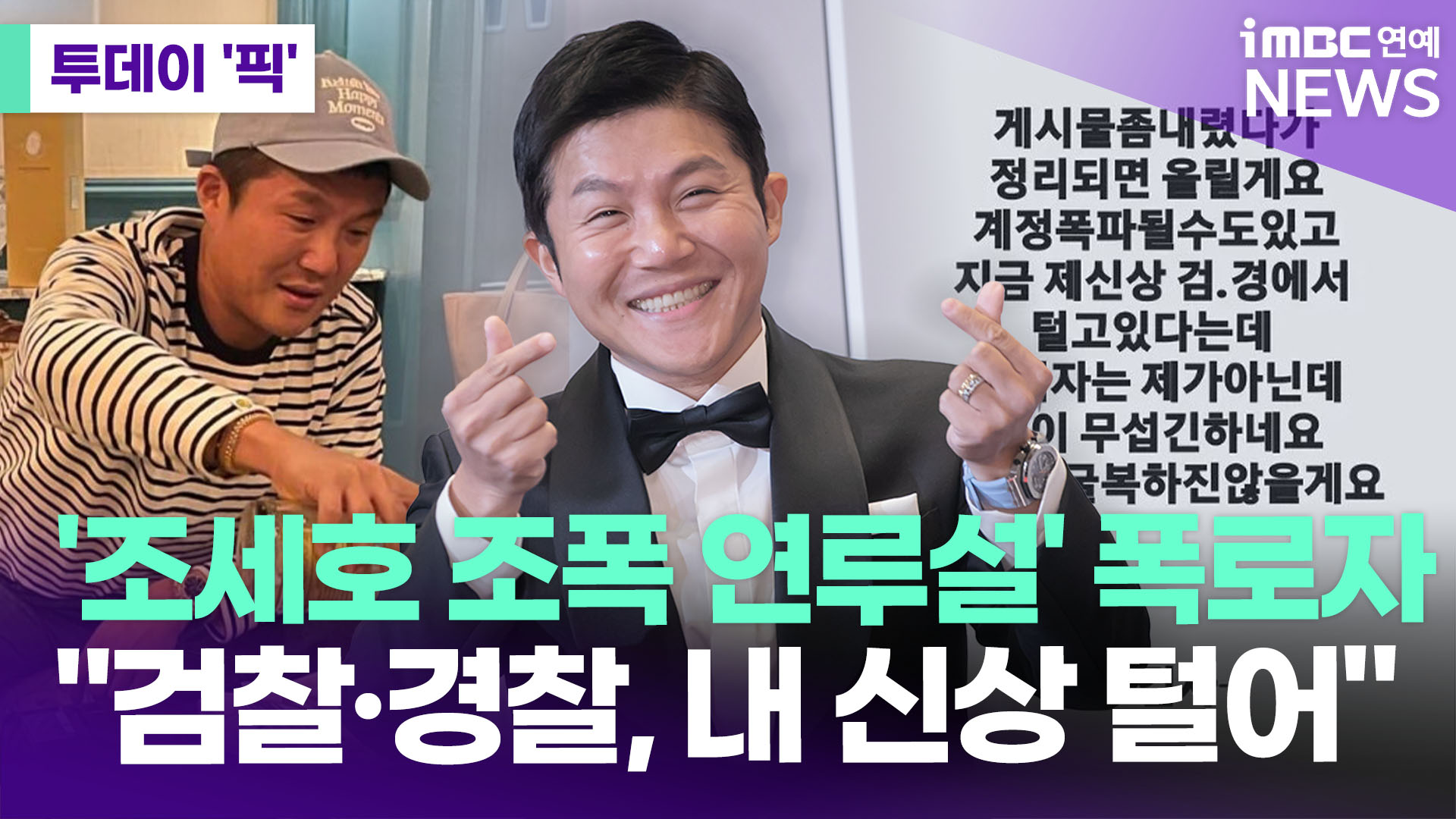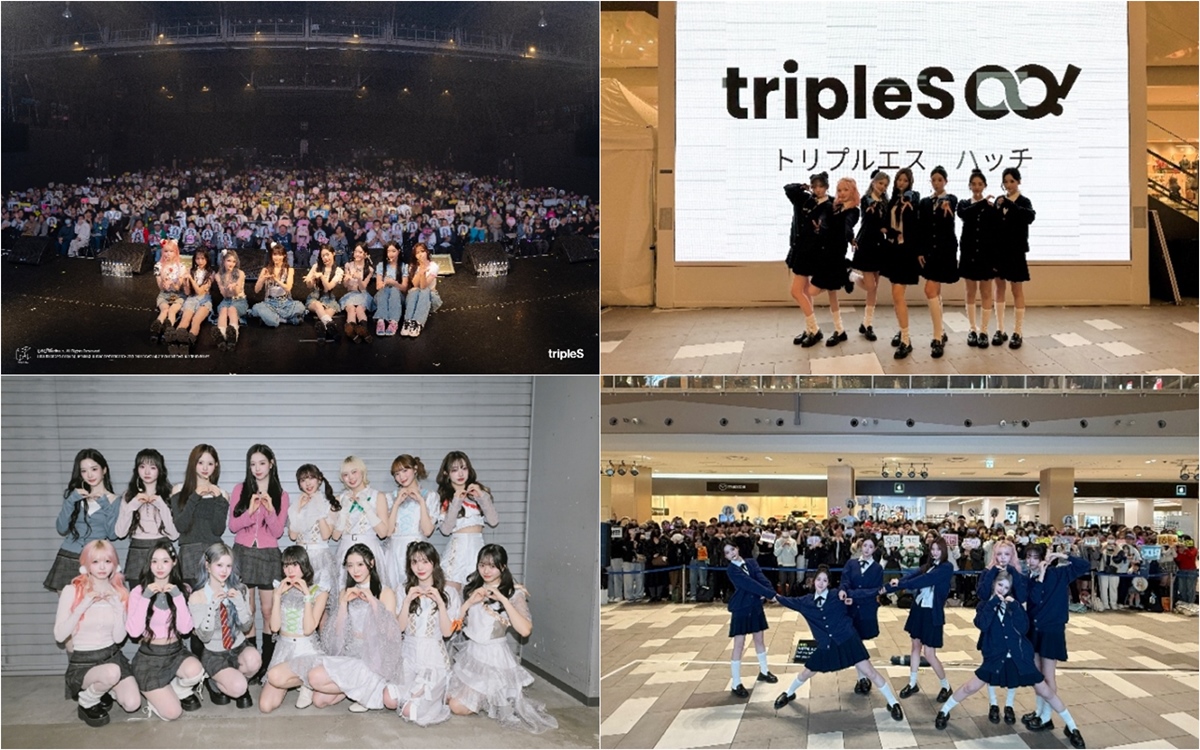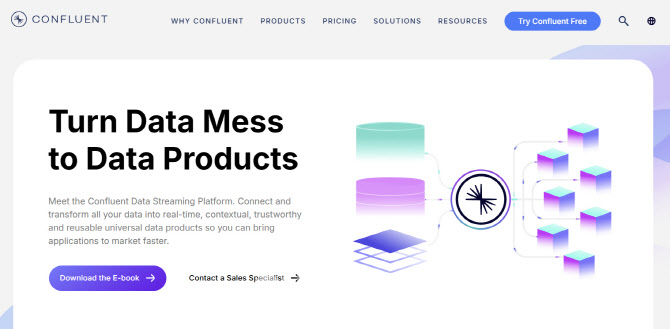병원 측은 낙태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뇌사자 엄마에 인공호흡기를 달아 생명 유지 조치를 취했다. 결국 4개월 만에 응급 수술로 아기가 태어났다. (사진=고펀드미)
챈스의 외할머니인 에이프릴 뉴커크는 기부 플랫폼 ‘고펀드미’를 통해 “현재 아기는 체중이 11파운드(4.98kg)밖에 나가지 않고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생활 중”이라고 밝혔다.
남아 기준 생후 5~6개월 아기의 평균 체중은 7.5~7.9kg이다. 그러나 미숙아로 태어난 챈스의 체중은 생후 1개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챈스를 낳은 뇌사자 엄마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에머리대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에이드리애나 스미스(30)다.
그는 지난 2월 극심한 두통과 호흡 곤란을 겪다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
당시 스미스는 임신 9주차였다. 조지아주에선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될 수 있는 임신 6주부터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병원 측은 낙태금지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스미스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 생명 유지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스미스 가족들의 동의는 얻지 않았다. 병원은 스미스의 태아가 최소 32주가 될 때까지 연명의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스미스의 어머니는 “선택권이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선택 자체를 박탈당한 점이 부당하다. 결정은 우리에게 맡겨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소호흡기가 달린 딸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 “고문”이라며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죽음에 의료적 조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컴패션 앤드 초이시즈’에서 선임 변호사로 일하는 제스 페즐리는 “이 임신한 사람은 무척 가슴 아픈 방식으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임신 초기에 뇌사 판정을 받은 임부가 강제 생명유지 조치를 거쳐 건강한 태아를 성공적으로 출산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하기도 했다. 뇌사 상태인 임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한 사례들이 보고된 적은 있지만, 대부분 임신 6개월쯤이나 그 후에 뇌사 판정이 내려진 경우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낙태 관련 법령이 유달리 엄격한 조지아주에서 스미스는 뇌사 상태로 연명 치료를 이어갔다. 그러다 결국 뇌사 판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6월 13일 오전 4시 14분,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들 챈스를 출산했다. 챈스는 822g의 미숙아로 태어나 곧장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스미스는 아이를 낳은 뒤 출산 4일 후 가족의 결정에 따라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해 사망했다. 스미스의 어머니는 언론에 “참으로 힘들다.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도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미국 연방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스미스와 같은 흑인 여성들은 구조적 의료 불평등과 낙태 제한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며 임산부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