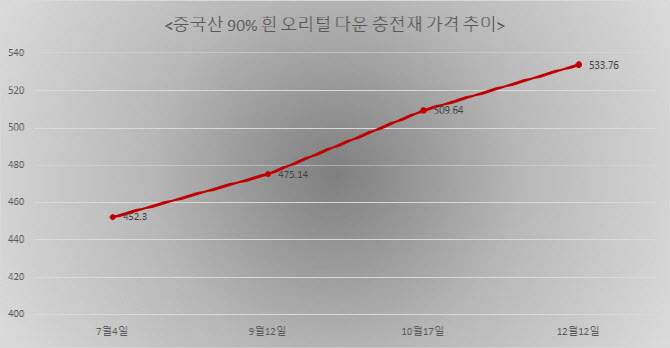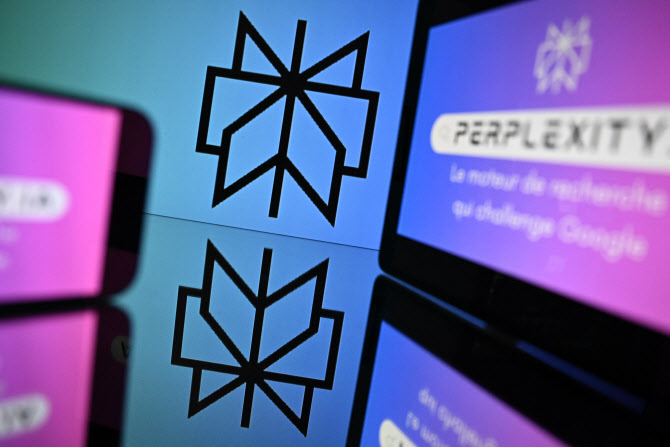
(사진=AFP)
생성형 AI는 거대언어모델(LLM)과 검색증강생성(RAG)을 결합한 방식을 기반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인터넷상 다양한 출처(소스)를 탐색해 정보를 조합한 뒤 답변하는 식이다.
문제는 생성형 AI가 답변 과정에서 인용한 기사의 원본 웹사이트 주소를 함께 제시해도 이용자가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협회는 이러한 ‘제로 클릭 검색’이 확산하면 뉴스 사이트 방문자가 줄어 광고 수입과 유료 구독자 확보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의 수입 기반이 훼손되면 추가 보도 활동에 재투입할 재원이 부족해 재생산 사이클이 타격을 입고, 궁극적으로 언론 기능 약화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내 주요 언론사들은 콘텐츠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는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AI 사업자가 정보 수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크롤러)을 상대로 ‘우리 기사를 읽지(인용하지) 말라’고 금지 규칙을 사이트에 미리 적어 두는 식이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 실질적인 효력을 부여하려면 법적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거부 표시를 무시한 채 기사를 수집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유럽연합(EU)이 학술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권리자의 거부 표시를 존중할 의무가 법률로 규정돼 있다고 소개하며, 일본에서도 권리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전제로 AI 학습을 제한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크롤러 이름(유저 에이전트)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떤 크롤러가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 수집 거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부 전문 데이터 수집 업체들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이들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언론사 입장에선 수익을 빼앗기는 셈이다. 협회는 “AI 사업자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 사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공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포괄적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생성형 AI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언급했다. 요미우리신문 3개 지역 본사(도쿄·오사카·서부)와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은 지난 8월 보도 콘텐츠 무단 이용을 이유로 퍼플렉시티를 각각 제소했다.
협회는 “대량의 보도 콘텐츠가 만연하게 무단 사용됨에 따라 소송 등 강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며 향후 지적재산추진계획에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규제 강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