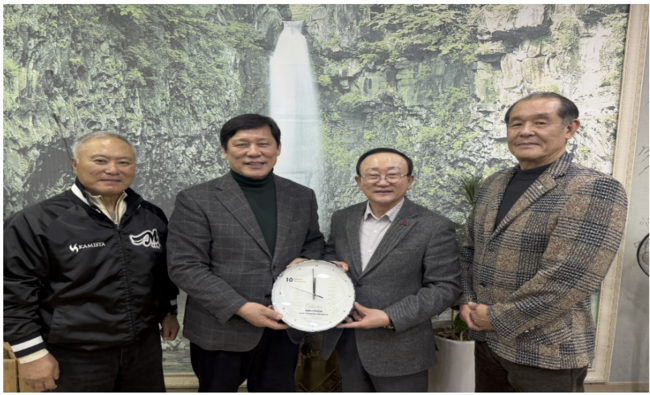(사진=AFP)
부동산 버블 붕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가 침체하자 중국 기업들은 비용 절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근로자와 결탁해 정규직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속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임금(인건비)을 과소 신고해 납부액을 줄이는 ‘꼼수’가 만연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미래 수입보다 당장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을 선호해 ‘현금 뒷거래’에 흔쾌히 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국 인사관리 시스템업체 중합운과가 전국 6689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법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업은 30%에 그쳤다. 닛세이기초연구소 추정에 따르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도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조차 지난해 기준 약 50~80%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최고인민법원(최고법원)이 비공식적인 노사 합의에 따른 납부 기피는 법률상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고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그동안 관행을 묵인해 온 지방정부도 더이상 눈감아주기 힘들어졌다.
사회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게 된 배경엔 연금 재정 악화가 있다. 지난해 기준 적립금 잔액을 월평균 지출액으로 나눈 수치가 12.5개월분으로, 10년 전보다 약 5개월 단축됐다. 연금 지불 여력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중국사회과학원은 9개월분을 ‘기준선’, 3개월분을 ‘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은 기준선 이상이지만 31개 성·직할시·자치구 중 절반 가까운 15개 지역은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고령화가 심각한 헤이룽장성 등 3개 지역은 위험수준이었던 2014년보다도 상황이 악화했고, 경제력이 높은 상하이, 저장성, 산둥성 등도 최근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19년 보고서에서 “현 추세라면 2035년엔 도시근로자기본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랴오닝성 다롄의 한 민간기업 직원은 “납부한 보험료가 나중에 제대로 돌아올지 불안하다”며 “성실히 내는 곳은 주로 국유기업이나 은행뿐”이라고 토로했다.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지만, 기업과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은 지방정부가 징수를 적극 강화하면 노동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감축이나 임금 삭감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 대기업 지방지사의 총경리는 “그간 미납했던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자 회사 이익이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일부 외식·서비스업체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정년퇴직자 고령 인력을 적극 채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젊은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16~24세 도시 청년층 실업률은 16.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전체(16~59세) 실업률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고용난이 악화하면 결혼·출산 기피를 초래하고, 저출산이 가속화해 궁극적으론 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