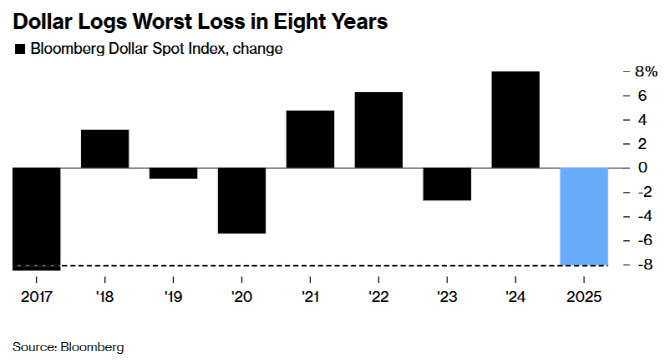애덤 포센 피터슨경제연구소 소장 (사진=피터슨경제연구소)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자 미 워싱턴 정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포센 소장이 말한 ‘유연성’은 AI 경쟁을 단순한 기술 개발 경쟁으로 보지 말라는 주문이다. 포센 소장은 “AI는 특정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성과를 내는 기술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업무 방식,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재교육 여건, 그리고 제도 환경이 함께 바뀔 때 비로소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며 “AI를 도입했느냐보다 도입 이후 사회와 경제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포센 소장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1990년대 미국의 생산성 도약을 언급했다. 당시의 성과는 일부 기술 기업의 혁신이 아니라, 유통·서비스 기업이 정보기술(IT)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나타났다. AI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기업과 산업이 이를 일상적인 도구로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기술 선점보다 활용 능력과 확산 속도가 결과를 가른다는 분석이다.
그는 특히 “사회적 수용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AI는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AI 정책은 산업 육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노동시장·사회안전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포센 소장은 “AI는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다”며 “기술 경쟁에 매몰되기보다 경제 전체가 AI를 사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한국은 충분히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센 소장은 아울러 글로벌 AI 경쟁 구도 역시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더 저렴하고 개방적인 AI를 앞세워 확산 속도에서 앞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AI 경쟁은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사회와 경제 전반에 더 잘 흡수했는가’를 가르는 싸움이라고 했다.
그는 AI를 둘러싼 거품 논쟁에 대해선 “거품론은 분명히 잘못됐다. AI의 생산성 효과는 서서히 스며드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포센 소장은 “모든 AI 투자가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품은 아니다”며 “AI에는 분명히 실체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핵심 변수는 규모가 아니라 시점이다. 포센 소장은 AI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쌓이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의 생산성 효과가 언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2~10년 사이 어느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