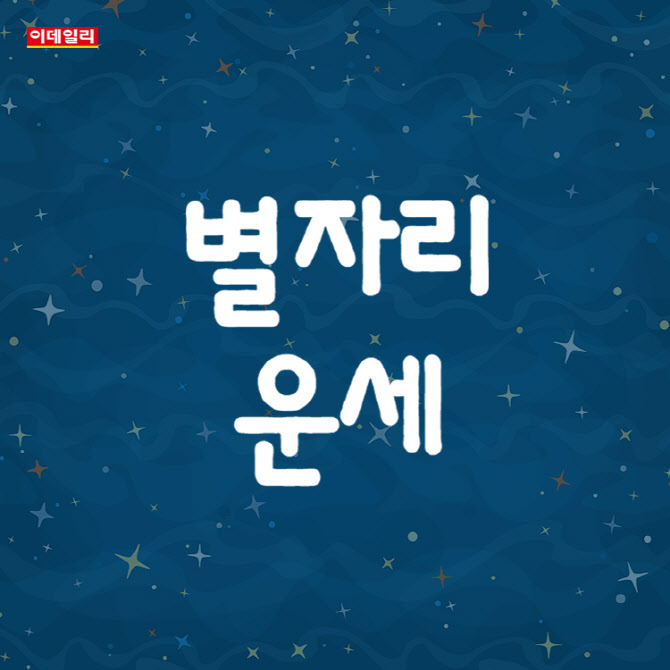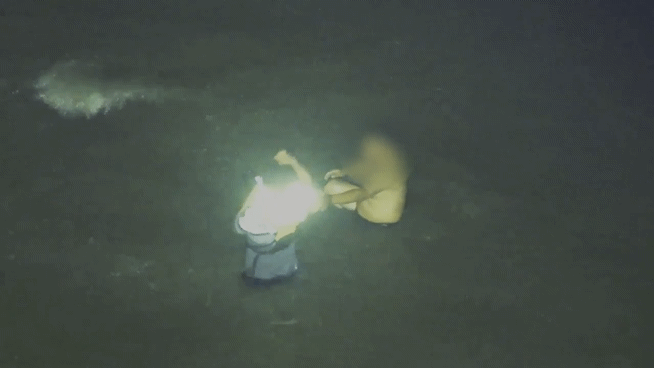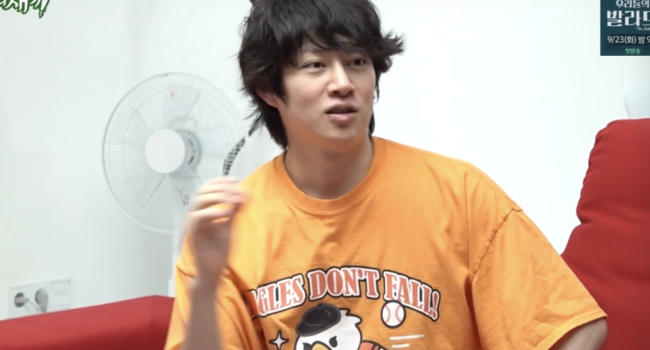(MHN 홍동희 선임기자)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터뷰 영상 하나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배우들이 작품의 핵심 주제로 “sisterhood(자매애)”를 언급했지만, 한국어 자막은 이를 “가족애”라는 단어로 옮겼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의미 같지만, 이 미묘한 차이가 작품의 세계관을 통째로 흔들었다.
작품의 서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비주력 여성들이 연대하고 싸워나가며 쟁취하는 ‘자매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리한 시청자들의 지적은 즉각 빗발쳤고, 넷플릭스는 결국 자막을 수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해야 했다.

단어 하나의 오역이 어째서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걸까? 글로벌 콘텐츠 시대의 시청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작품의 서사는 물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맥락과 뉘앙스까지 파고드는 ‘적극적 감시자’에 가깝다. ‘자매애’를 ‘가족애’로 뭉뚱그린 것은 단순한 번역 실수를 넘어, 창작자가 전달하려던 핵심 메시지를 흐리고 작품의 영혼을 왜곡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더욱 선명해진다.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가 세계 팬덤의 언어가 되고 K드라마와 영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지금,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를 잇는 섬세한 다리이자, 원작에 대한 존중을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팬들은 K-콘텐츠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그 가치가 전달 과정에서 훼손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제는 이번 ‘자매애’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거 BTS의 인터뷰 자막이 멤버의 의도와 다르게 번역되거나, 한국 드라마 속 대사의 사회적 풍자가 무시된 채 단편적으로 직역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전 세계에 콘텐츠를 유통하면서도 정작 문화의 본질을 전달하는 ‘맥락 번역’의 중요성은 여전히 후순위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팬덤의 집단적 피드백은 무시할 수 없는 감시망으로 작동한다. SNS를 통해 오류는 실시간으로 공유 및 공론화되고, 번역의 정확성은 곧 플랫폼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번역 품질은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을 넘어, ‘창작자의 의도를 온전히 전달하는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삼는 OTT 플랫폼에게 번역은 더 이상 비용 절감을 고민할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번역 인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감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자매애’와 ‘가족애’의 차이가 보여주듯, 단어 하나가 작품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변질시킬 수 있다. 이번 논란은 글로벌 K-콘텐츠 시대에 번역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존중과 신뢰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켰다.
사진=넷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