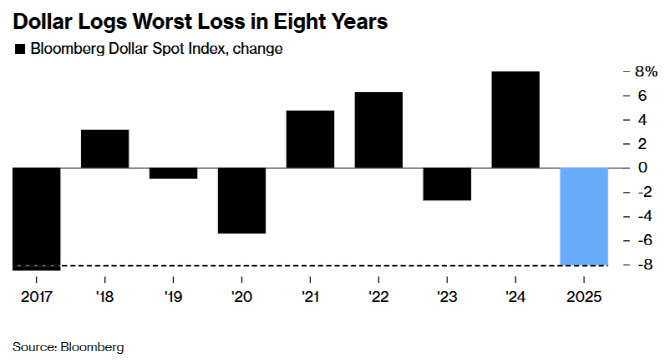[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6년 여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축구의 최대 이벤트 월드컵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엠블럼
이번 월드컵은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린다.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분산 개최한다. FIFA는 북미 대륙 전역을 아우르는 초대형 이벤트를 통해 글로벌 노출과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참가국 확대다. FIFA는 “더 많은 나라에 월드컵 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지역에 배정된 출전권을 크게 늘렸다. 조별리그 경기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공동 개최에 따른 이동 문제도 논쟁거리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오가는 선수들은 체력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팬들도 높은 이동 비용과 복잡한 동선 등 현실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팬들 사이에서는 ‘월드컵이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여행 상품이 됐다’는 냉소적 반응까지 나온다.
경기 수 증가와 이동 거리 확대는 선수 혹사 문제로 직결된다. 조별리그를 통과해도 32강부터 토너먼트를 시작해야 한다. 우승까지 가려면 이전보다 1경기를 더 치러야 하기에 선수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제선수협회는 이미 “지속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경고했다.
상업화 논란은 핵심 쟁점이다. 경기 수 증가는 곧 중계권·광고·스폰서 수익 확대를 의미한다. FIFA는 월드컵을 단순한 축구 대회가 아닌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정의 중심에 선수와 팬보다 수익 논리가 앞선다’는 비판이 따라다닌다.
한국 축구에도 이번 월드컵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를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D조 통과팀과 함께 A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인 8강 도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참가국 확대로 본선과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은 과거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목표인 8강에 오르려면 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 축구의 슈퍼스타인 ‘캡틴’ 손흥민(LAFC)에게 사실상 ‘라스트 댄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강인(파리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해외파 황금세대’가 함께 나서는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부담이 교차한다.
대표팀을 둘러싼 지도부 논란과 대한축구협회 운영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협회를 향한 비판의 소용돌이는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역대 가장 크고, 가장 돈이 되는 대회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월드컵이 너무 커진 것 아닌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진다. 이번 월드컵은 축구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이자, 월드컵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손흥민의 라스트 댄스 될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