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이주환 기자) 지역 케이블에 중계를 맡기고 앉아서 돈을 받던 MLB의 ‘황금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외주 제작’ 중심이던 지역 중계가 사무국이 주도하는 ‘직영 제작’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흐름이다. 변화는 조용하지만 파괴적이다. 중계 화면 뒤의 ‘물주’가 바뀌면, 구단의 지갑 사정과 로스터 운영 방식까지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SBJ)은 지난 2일(현지시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메인 스트리트 스포츠 그룹(Main Street Sports Group)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올해부터 MLB 네트워크가 직접 방송 제작을 맡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카디널스는 지역 스포츠 케이블 네트워크(RSN)에 안방 경기를 내주고 막대한 중계권료를 챙겨왔다. 이 수입은 구단 전체 예산의 20~30%를 책임지는 핵심 자금줄이었다.
하지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균열은 ‘대금 미지급’ 사태에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메인 스트리트 그룹이 지난해 말부터 약 2개월간 중계권료 지급을 미루자, 참다못한 카디널스가 ‘손절’을 택했다. 이는 단순한 파트너 교체가 아니라, 기존 지역 중계 생태계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탈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카디널스뿐만 아니다. SBJ는 탬파베이, 밀워키, 신시내티, 캔자스시티, 마이애미 역시 기존 RSN을 떠나 MLB 네트워크 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애틀랜타, 에인절스, 디트로이트까지 합류가 유력해지면서, 총 9개 구단이 ‘RSN 엑소더스(대탈출)’를 감행하는 초유의 그림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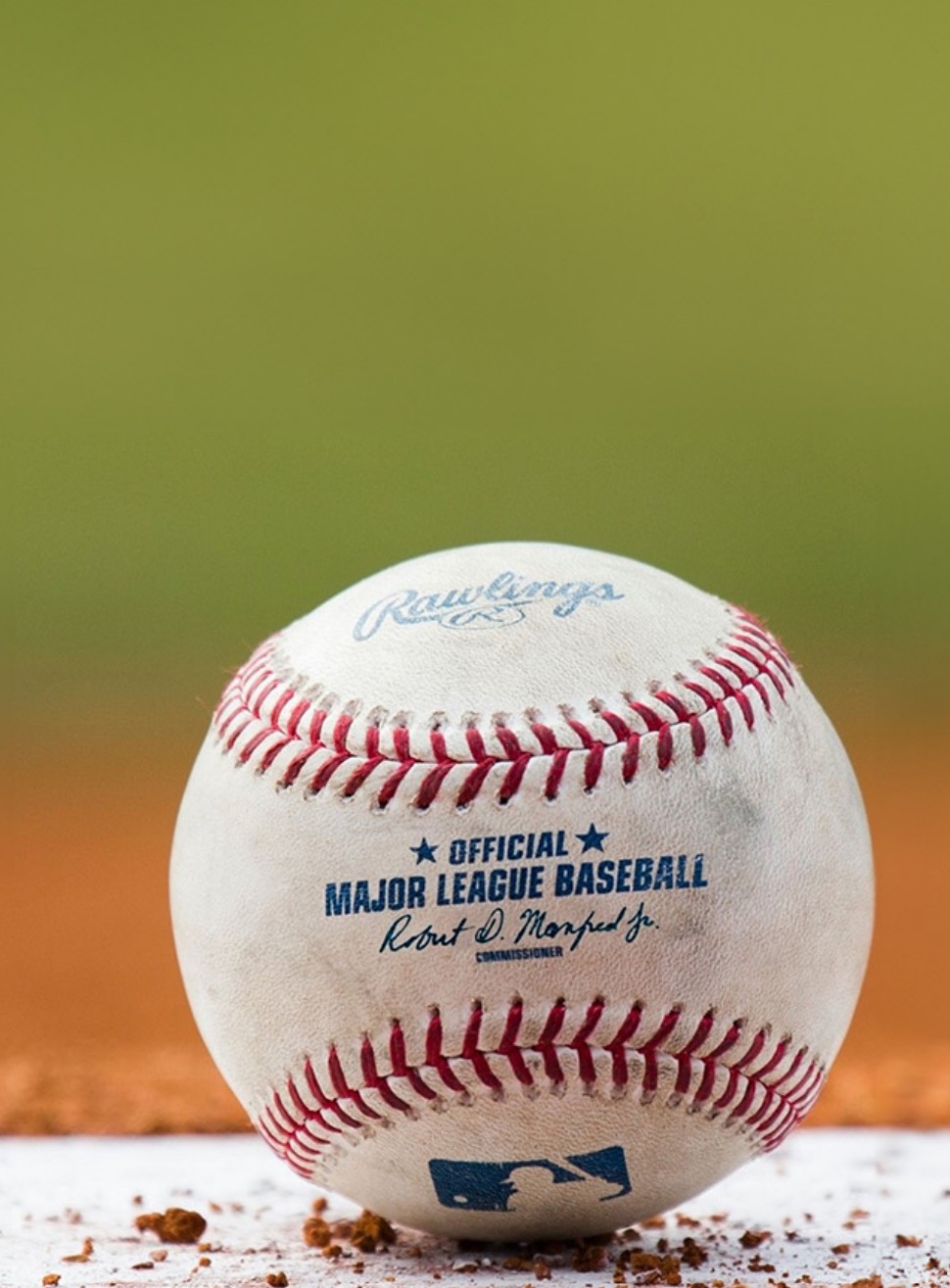
팬들에게는 뜻밖의 호재다. 악명 높은 ‘블랙아웃(Blackout)’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RSN이 중계권을 쥔 지역의 팬들은 MLB.TV를 결제하고도 정작 내 팀의 경기는 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한을 겪었다. 하지만 9개 구단이 사무국 직영으로 편입되면서, 연고지 팬들은 이제 케이블 TV 없이도 스트리밍으로 안방 경기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다. '돈'이 문제다. RSN이 보장해주던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 구단 재정은 일시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구단은 불확실한 중계권 수입을 이유로 FA 시장에서 지갑을 닫거나 연봉 총액을 줄이는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중계권료라는 든든한 ‘숨은 기둥’이 흔들리자, 당장 그라운드 위의 전력 투자부터 위축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MLB 사무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사무국은 장기적으로 30개 구단의 중계권을 모두 회수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미 지난해 ESPN(연평균 5억 5000만 달러), NBC(2억 달러)에 이어 넷플릭스와도 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으며 판로를 넓혔다.
지역 케이블의 몰락은 결국 야구 중계의 ‘제작과 유통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대한 거대한 패권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LB TV, MainStreetSports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