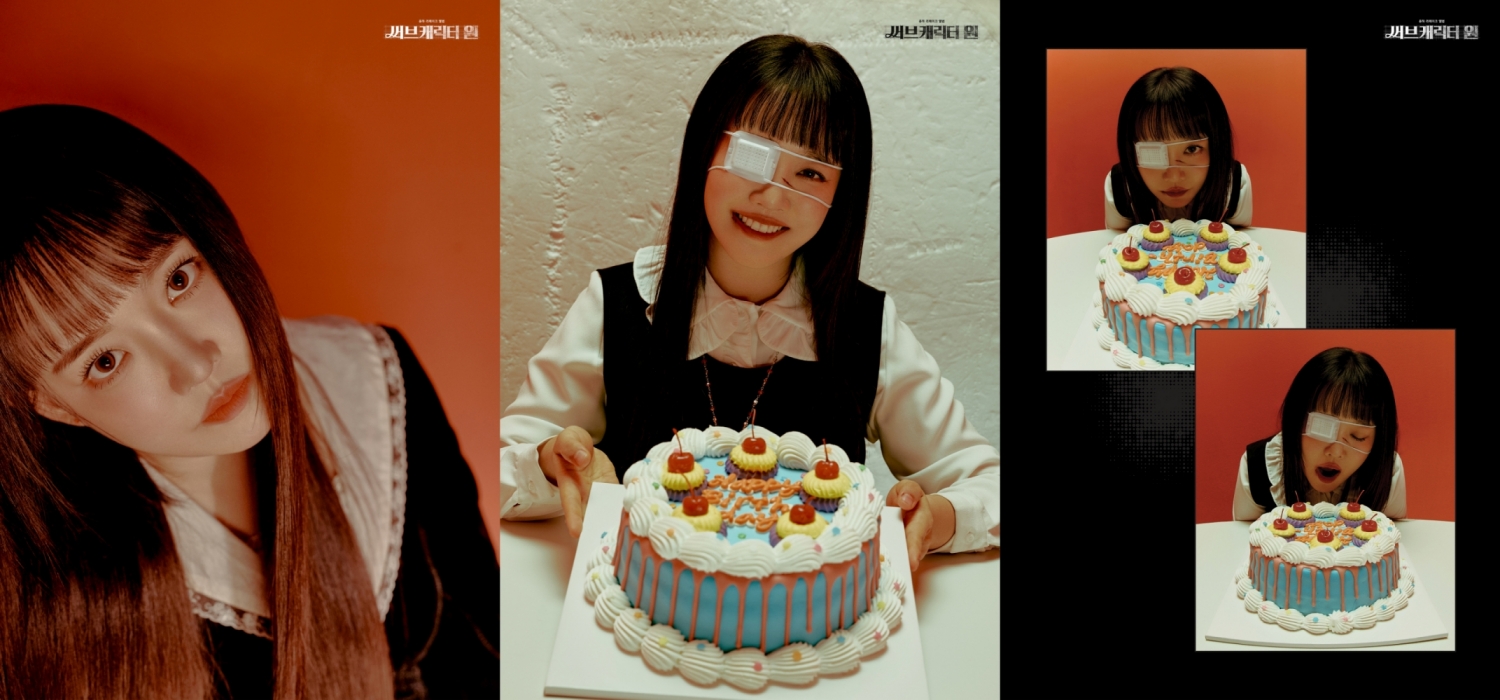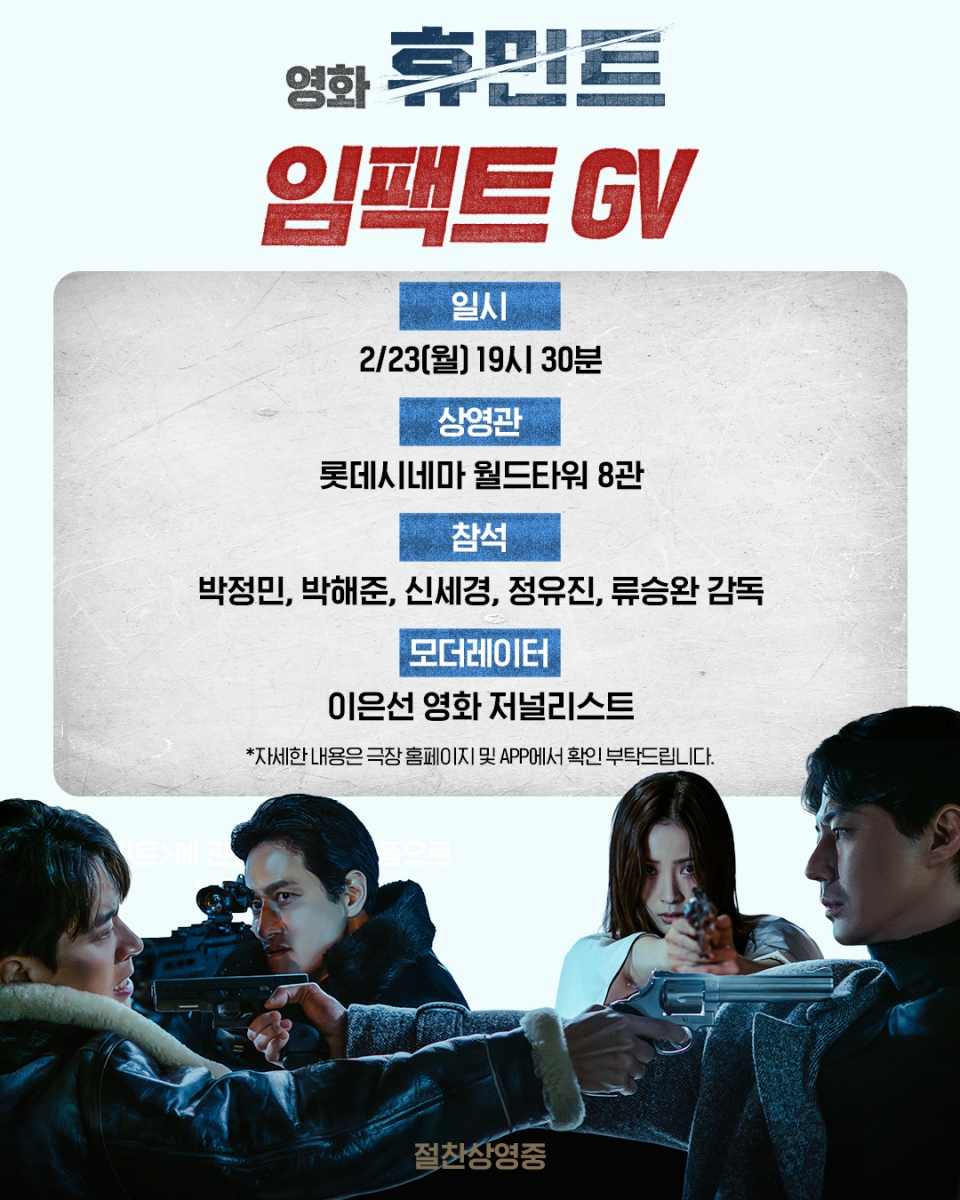[OSEN=이인환 기자] 숫자는 낮다. 3.36%. 그래도 ‘빅6’로 묶이던 토트넘이 이제는 생존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됐다.
[OSEN=이인환 기자] 숫자는 낮다. 3.36%. 그래도 ‘빅6’로 묶이던 토트넘이 이제는 생존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됐다.
‘디 애슬레틱’은 지난 20일(한국시간) 토트넘이 챔피언십으로 떨어질 경우 발생할 연쇄 효과를 구조적으로 짚었다. 8경기 연속 무승, 강등권과 촘촘해진 승점 간격. 데이터 모델은 생존을 가리키지만, 흐름은 낙관을 허락하지 않는다.
구단이 이고르 투도르를 임시 사령탑으로 호출한 선택 역시 위기 인식의 결과다. 과거 세리에A에서 잔류 경쟁을 수습했던 이력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부진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강등이 현실이 될 경우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선수단이다. 기예르모 비카리오, 페드로 포로, 데스티니 우도기, 미키 판 더 펜, 크리스티안 로메로로 이어지는 수비 축은 2부 리그에 머물 가능성이 낮다.
중원의 코너 갤러거와 로드리고 벤탄쿠르 역시 최고 무대를 선호할 자원이다. 공격진도 마찬가지다. 도미닉 솔란케, 모하메드 쿠두스,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셉스키, 사비 시몬스, 히샬리송. 전성기 선수들이 챔피언십에서 시간을 보낼 이유는 제한적이다. 강등은 곧 스쿼드의 구조적 해체를 뜻한다.
재정 충격은 더 구체적이다. 토트넘은 최근 시즌 약 6억7260만 유로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구단이다. 당장 생존이 위태로운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이탈은 직접 타격이다. 2025-29년 국내 중계권 규모만 67억 파운드에 달한다. EFL 계약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 스폰서십도 변수다. 연 4000만 파운드 규모로 알려진 AIA 계약은 강등 시 재협상 압박이 불가피하다. 노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즌권 가격 인하 요구 역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빅6’의 의미가 흔들린다. ‘스포츠 바이블’은 “얼마나 부진해야 더 이상 빅6가 아닌가”라는 팬들의 질문을 전했다. 2024-2025시즌 17위로 간신히 잔류했고, 이번 시즌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 챔피언스리그 경쟁은 물론 유럽 대항전 진입조차 멀어졌다.
전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웨인 루니가 “강등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직설한 배경이다. 상징보다 순위표가 더 정확하다는 지적이다.
프리미어리그의 ‘빅6’는 성적·재정·글로벌 영향력의 합성어였다.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그리고 토트넘. 그러나 최근 몇 시즌은 그 구도가 고정값이 아님을 보여준다.
뉴캐슬과 아스톤 빌라가 상위권을 위협하며 권력 지형을 흔들고 있다. 지위는 영구적 개념이 아니다.
완충 장치는 있다.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은 NFL 경기와 대형 콘서트를 통해 비축구 수익을 창출한다. 단기 재정 파탄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이미지다. 프리미어리그 무대 이탈은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 직격탄이다. 2026년 북미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노출 감소는 신규 팬 유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질문은 단순하다. 강등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순위표 하단이 일상이 된 팀을 언제까지 ‘빅6’라 부를 수 있을까. 이름이 아니라 성적이 지위를 증명하는 시대지만 토트넘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mcado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