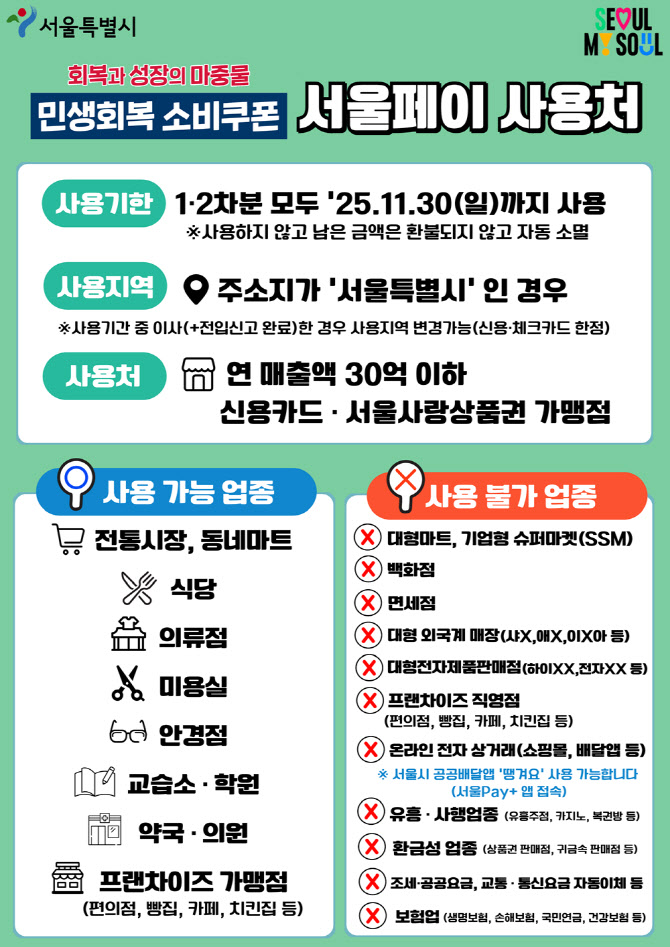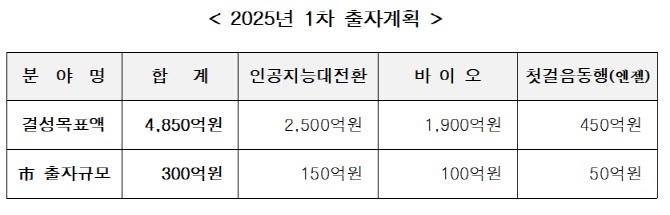음악도 음악이지만 이들의 대중적 인기에는 또 하나 요소가 개입했다. 팀의 핵심이었던 리암 갤러거와 노엘 갤러거 형제간의 불화와 반목이었다. 공사를 막론하고 걸핏하면 둘은 말다툼을 벌이고 적대시했다. 도저히 한 뱃속에서 나온 형·동생 사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이자 공동체적 가치로도 해석되는 ‘형제애’란 말은 무색했고 ‘의좋은 형제도 다투게 되면 그 앙심이 빗장 같아 꺾이지 않는다’는 구약성서 잠언이 딱 들어맞을 정도였다.
팝 역사에서 형제의 위상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의 화기애애가 아닌 오히려 거의 피 터지게 싸우는 앙숙의 이미지에 가깝다. 밴드 킨크스의 데이비스 형제 레이와 데이브는 한 콘서트에서 서로 주먹질에다 병 깨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피웠다. 화목한 느낌에 어른 팬도 많았던 전설의 에벌리 브라더스 형제 돈과 필은 속으로 갈등이 미어터진 끝에 1973년 공연 도중 사고를 쳐 충격을 던졌다. 그 점잖던 인상의 동생 필이 기타를 바닥에 박살 내고 무대를 뛰쳐나가 버린 것이었다. 돈은 나중 기자회견에서 “사실 에벌리 브라더스는 10년 전에 죽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열풍을 일으킨 밴드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CCR)도 네 살 위의 형인 톰 포거티가 동생 존 포거티의 우월한 능력에 뒤틀려 팀을 나가버렸다. 이 외에도 음악계에서 형제들의 불화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사실은 우리 같으면 볼썽사나운 이런 갈등이 꼭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상보다는 비정상이 눈에 띄고 조용함보다는 소란스러움을 챙기는 특유의 반항 록 문화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불구경, 싸움구경을 좋아하는 탓일까. 형제의 충돌이 도리어 대중의 관심을 자극하면서 오아시스 밴드를 향한 숨길 수 없는 묘한 이끌림이 상승했다. 여기까지의 반목은 순기능.
사고는 터지기 마련이다. 누가 봐도 불안한 징후가 뚜렷했던 노엘과 리암은 2009년 오랜 갈등이 폭발, 스타디움 공연에서 싸움이 났고 그걸로 오아시스는 끝났다. 둘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각자의 밴드를 꾸려 오랜 기간 동행을 바라는 팬들의 기대를 철저히 거부했다. 위력은 대등한데 추진력은 정반대였던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 관계, 그래서 성사되지 못한 비틀스의 재결합 상황이 이들에게도 재현될 것만 같았다.
이제 비로소 형제의 진정을 깨친 것인지 둘은 지난해 여름 갑작스레 재결합 소식을 알렸다. 오아시스 소셜미디어 계정에 “총성이 조용해졌다”는 글이 올랐다. 국내 팬들도 이 깜짝 뉴스에 들끓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웨일스의 카디프 지역을 시작으로 16년 만의 재결합 공연에 돌입했다. 빌보드 등 음악 언론도 이 첫 공연을 두고 “이제 새벽이 밝았다”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호감 못지않게 미움이 어느 정도는 관계의 활력소가 된다. 앞서 언급한 킨크스의 경우 ‘증오는 우리 형제를 엮어준 유일한 요소’라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다. 오아시스가 지금까지 오는 데 증오도 효력을 발휘했다. 갈등과 알력은 봉합하기만 하면 존재감도 높아질뿐더러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인다. 오아시스는 친한(親韓)밴드답게 한국 공연도 잡았다. 10월인데 표 구하기가 전쟁 수준이다. 요즘 공연 부문은 음악판이 가장 원하는 ‘활기’를 되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