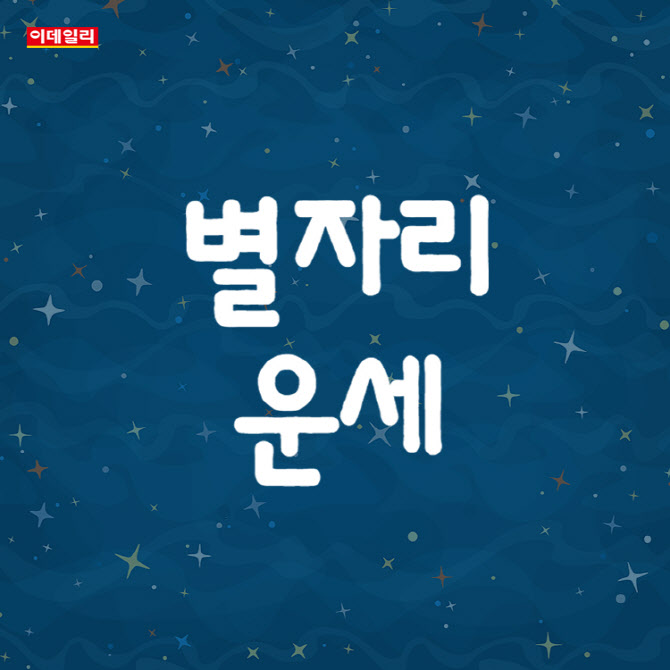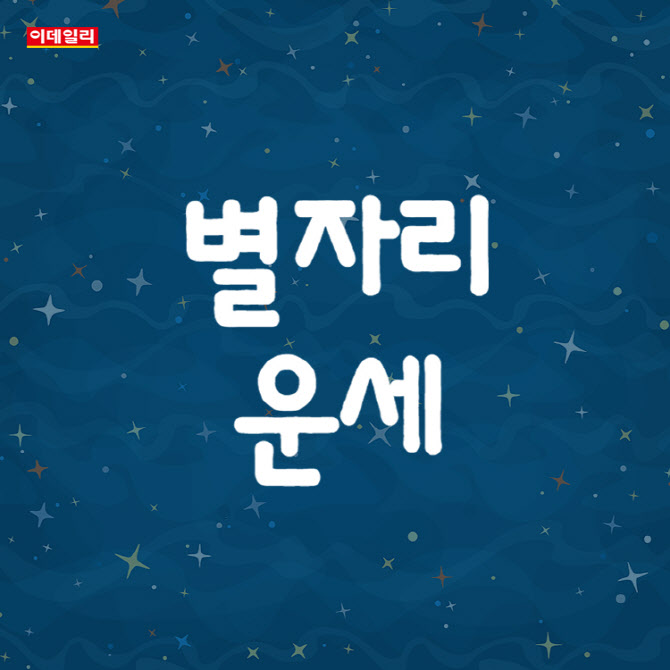세상을 바라보는 젊은 안무가들의 시선에서 세 편의 무용극이 탄생했다. 정소연의 ‘너머’, 이지현의 ‘옷’, 박수윤의 ‘죽 페스’가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국립무용단 ‘2025 안무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3명의 안무가 신작을 트리플빌(Triple Bill, 세 작품을 한 무대에 구성하는 형식) 형태로 무대에 올린다.
2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분장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소연 안무가는 “AI 시대에 인간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본질을 한국춤의 호흡에서 찾았고, 이러한 움직임이 미래에도 어떤 형태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 작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립무용단 ‘2025 안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지현(왼쪽부터), 정소연, 박수윤 안무가(사진=국립극장).

정소연 안무가의 ‘너머’(사진=국립극장).

이지현 안무가의 ‘옷’(사진=국립극장).
박 안무가는 “휘파람 소리는 죽음을 앞둔 이의 마지막 숨을 상징하고, 종소리는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장례의 이미지를 불러오는 장치”라며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 경험을 계기로, 이를 슬픔이 아닌 축제로 풀어보고자 했다”고 전했다.

박수윤 안무가의 ‘죽 페스’(사진=국립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