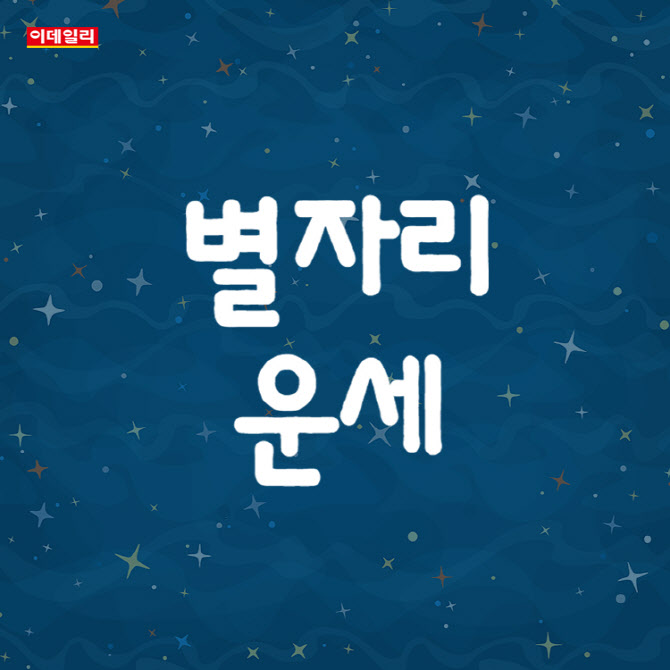그 길은 태안의 바다를 따라 천천히 이어진다. 백사장항에서 시작해 삼봉해변과 기지포 해안사구, 방포해변을 지나 꽃지해변으로 닿는 약 12㎞ 길이 해안길이다. 평탄한 길이 대부분이라 천천히 걸으면 세 시간 반이면 충분하다. 길은 늘 바다를 곁에 둔다. 모래의 결이 달라지고 바람의 냄새가 바뀌며 빛의 깊이가 변한다. 누군가는 이 길에서 하루를 떠나보내며 마음을 비우고, 누군가는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 묶는다. 노을이 바다를 덮는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간을 되돌아본다. 안면도의 가을은 그렇게 풍경과 마음을 함께 물들인다.

꽃지해변의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로 떨어지는 일몰은 사진가들이 꼽는 서해안 최고의 일몰 촬영 명소로 꼽힌다.
◇바다에서 시작된 길을 따라 걷다
백사장항은 노을길의 출발점이자 안면도 동서 트레일 1구간의 중간 지점이다. 항구는 늦은 오후에도 여전히 분주하다. 회를 뜨는 손놀림과 생선 굽는 냄새, 포구를 오가는 트럭의 엔진 소리가 뒤섞인다. 항구 끝자락엔 윤슬공원이 자리한다. ‘윤슬’은 햇빛이 물결에 부딪혀 반짝이는 모습을 뜻한다. 이름처럼 바다는 잔잔했고 햇살은 은빛 파도 위에서 반사됐다.
공원 끝으로 걸어가면 드르니항과 백사장항을 잇는 ‘대하랑 꽃게랑’ 인도교다. 다리의 난간은 파도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든다. 발 아래로 고깃배가 오가고, 물 위에는 갈매기가 낮게 날았다. 다리 위에선 두 항구가 동시에 보인다. 뒤쪽으론 붉은 지붕의 백사장항, 앞쪽으론 조용한 드르니항이 있다.

드르니항과 백사장항을 잇는 ‘대하랑 꽃게랑’ 인도교 노을

드르니항과 백사장항을 잇는 ‘대하랑 꽃게랑’ 인도교

방포항 윤슬공항
낚시꾼들이 다리 아래 모래톱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그 옆에서 아이가 모래성을 쌓는다. 연인은 난간에 기대 바다를 바라본다. 바람은 짭조름하고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깜박인다. 윤슬교는 단순한 인도교가 아니라 바다와 사람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잇는 다리다.
백사장항을 벗어나면 곧 해변길이 열린다. 도로와 바다가 나란히 이어지고 소나무 숲길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백사장항에서 삼봉해변까지는 약 2.8㎞. 길 양쪽에는 해안식물이 드물게 남아 있고 갈대가 군락을 이룬다. 바람이 스치면 잎이 흔들리고 모래 위에 바람의 결이 새겨진다.

삼봉해변으로 가는 길은 해안을 따라 길게 해송이 늘어서 있다. 해송이 해변을 따라 길게 뻗어 있다. 솔잎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파도소리와 섞여 묘한 울림을 만든다.

삼봉해변은 이름처럼 세 개의 봉우리가 바다를 향해 서 있다.

삼봉해변은 이름처럼 세 개의 봉우리가 바다를 향해 서 있다.
삼봉해변은 이름처럼 세 개의 봉우리가 바다를 향해 서 있다. 해안선은 완만하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낮게 일렁인다. 해송이 해변을 따라 길게 뻗어 있다. 솔잎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파도소리와 섞여 묘한 울림을 만든다. 햇살은 수평선 쪽으로 기울고 하늘은 조금씩 붉어진다.
삼봉을 지나면 기지포 해안사구로 이어진다. 이곳은 바람이 만든 언덕이다. 수천 년 동안 쌓이고 깎이며 지금의 모양새를 갖췄다. 길은 사구를 돌아 나가며 모래와 풀, 바람이 한데 어우러진다. 갈대가 흔들리고 갯그령과 해당화가 그 사이에서 몸을 세운다. 안내 덱이 설치돼 식생을 보호하며 걸을 수 있다. 덱 아래엔 작은 게와 조개가 남긴 흔적이 모래 위에 가늘게 이어진다.

바라미 만든 언덕인 기지포 해안사구.
사구를 지나면 숲길이 시작된다. 길은 완만한 오르내림을 반복한다. 곧게 자라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해송 사이로 가을빛이 스며든다. 바람은 잦아들고 대신 흙과 수액의 냄새가 짙어진다. 새소리가 들리다 이내 멎고 대신 나무가 내는 미세한 마찰음이 귀를 채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질수록 풍경이 선명해진다. 길을 따라 걷던 한 중년 부부가 말을 멈추고 발걸음을 멈춘다. “바람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리네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그 말 뒤로 다시 고요가 내려앉는다.

방포전망대에 서면 삼봉해변과 기지포, 꽃지해변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이 하눈에 들어온다.
숲이 끝나면 방포해변이 모습을 드러낸다. 넓은 모래사장으로 낮은 파도가 밀려온다. 방포는 안면도의 여러 해수욕장 중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한 곳으로 손꼽힌다. 해안선을 따라 천연기념물 제138호 방포 모감주나무 군락이 있다. 여름엔 노란 꽃이 피고 가을엔 붉은 열매가 달린다. 그 나무 아래로 모래가 부드럽게 깔리고 바람은 가지 사이를 통과한다.
길은 방포전망대로 이어진다. 전망대는 나무 덱 형태로 되어 있다. 유리벽 하나 없이 서해의 바람이 그대로 통한다. 그 위에 서면 삼봉해변과 기지포, 멀리 꽃지해변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오후의 빛이 서쪽으로 기울고, 바다는 서서히 붉은 기운을 띤다. 사람들의 발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길은 고요해진다.
꽃지해변은 노을길의 마지막 구간이다. 해가 수평선 위로 내려앉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걸음이 느려진다. 해변 끝에는 할미, 할아비 바위가 나란히 서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를 견뎌온 두 바위는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해를 맞고 또 보낸다.

방포항 꽃다리
해가 완전히 바다 속으로 사라지면 길은 어둠 속으로 잠시 사라진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여전히 빛의 잔향이 남는다. 모래는 서늘하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걷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해변을 따라 돌아간다. 누군가는 손을 잡고 누군가는 혼자 걷는다. 바다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사람은 그 하루를 품는다.
걷는 일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일이다. 바다는 매일 다른 얼굴을 하고, 해는 같은 자리에서 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루를 떠나보내고 내일을 맞는다. 안면도의 가을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진다.

사진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일몰로 꼽히는 꽃지해변 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