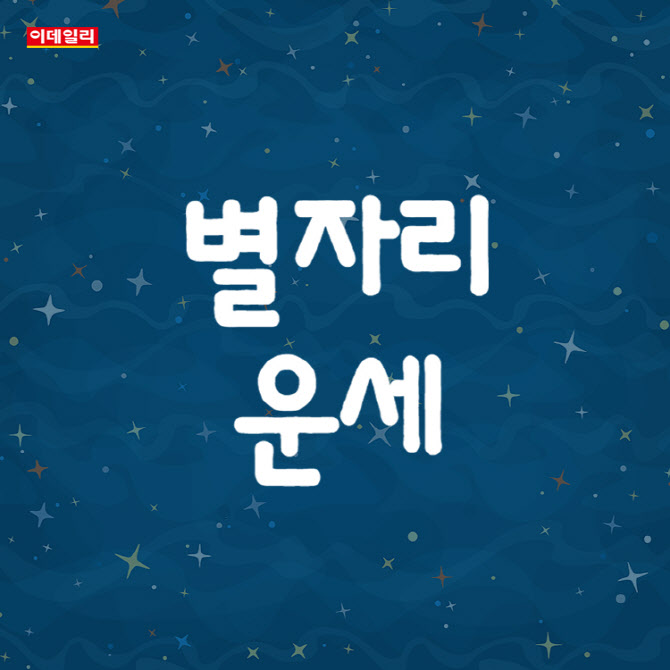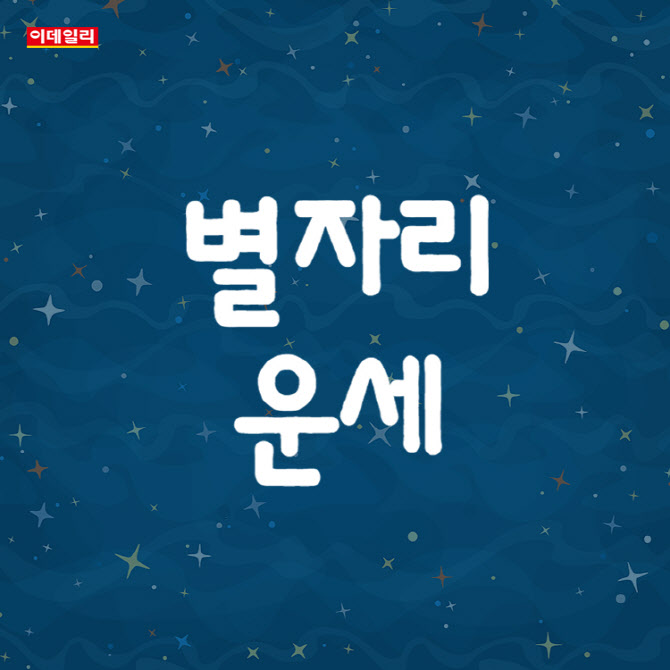뉴스1DB
배우 배정남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보낸 반려견 벨과 늘 걷던 남산 산책로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을 발견한 뒤, 49일 동안 다시 그곳을 찾아 소주·막걸리를 붓고 노잣돈을 묻었다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배정남의 이 같은 행동을, 반려동물과 오랜 기간 교감을 나눈 주인에게서 나타나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의 전형적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배정남은 무속인 상담 도중 "반려견 벨과 산책하다가 시신을 발견한 적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멀리서 운동하는 사람으로 착각했으나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 다가갔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했다. 신고 후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끈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혼자서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에도 그는 그 산책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반려견과 오랜 시간 함께 산책하던 장소를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반려견을 추억하며 매일 그곳을 찾아 49일간 소주·막걸리를 뿌리고, 땅에 노잣돈을 묻었다"고 말했다.
한 달 전 반려견 벨을 떠나보낸 뒤 이어진 심리적 공백이 '의례적 행동'과 맞물리며, 감정 조절을 위한 일종의 애도 과정으로 작용한 셈이다.

배정남과 세상을 떠난 반려견 벨. 출처=미운우리새끼
상실 직후의 강한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
국제 건강의학 매체 헬스라인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별 직후 나타나는 우울감은 전 세계적으로 애견인들이 흔히 겪는 '정상 애도 반응'이다. 슬픔, 공허감, 일시적 무기력, 수면 변화, 죄책감 등은 자연스러운 범위에 속하며, 이를 곧바로 정신질환으로 진단하지는 않는다.
미국 정신의학회 역시 "상실 직후의 강한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자 행위이며, 이를 우울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의학 전문지 코리아바이오메디컬을 통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남궁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배우자나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상실도 같은 범주의 우울 반응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간과 강도에 따라 치료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
남궁 교수는 애도 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반려동물 사별 후 0~6개월 사이 나타나는 슬픔, 무기력, 반복적 울음, 일상 루틴 붕괴 등은 모두 정상적 애도 반응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슬픔의 강도와 빈도가 줄지 않고 일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연성 애도 반응'으로 분류되며, 이때는 약물·상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매체 또한 반려동물 상실 후 6개월 이상 슬픔이 지속되고 기능 저하가 뚜렷할 경우 독립 질환으로 인정되는 '장기 애도장애(PGD)'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PGD는 단순 슬픔의 범주를 넘어 삶의 의미 상실, 정체감 혼란, 반복되는 죄책감, 사회적 고립, 반려동물 관련 장소·물건 회피 등 기능적 장애를 동반한다. 이 단계에서는 치료가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배정남이 반려견 벨과 함께 걷던 산책로에서 신원미상의 시신을 본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출처=미운우리새끼
"슬픔 6개월 이상 완화되지 않으면 장기 애도장애 상담 받아야"
반려동물의 죽음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됐다. 반려동물은 보호자에게 무조건적 애착과 충성심을 보이며, 보호자 역시 수면·식사·산책·일상 활동 전반이 동물 중심의 루틴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반려동물의 죽음, 병원 이송, 안락사 결정 과정은 PTSD 유사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 헬스라인은 이를 "인간 가족의 상실과 동일하거나 더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슬픔과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누구나 겪는 '정상적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반려동물을 기리는 의례(사진, 편지, 메모리 박스)를 통해 자연스러운 관계의 마무리를 돕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감정 기록(일기 등), 규칙적인 수면·영양·가벼운 운동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고, 슬픔이 6개월 이상 완화되지 않으면 전문가 상담을 요청해 우울증 또는 장기 애도장애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깊었다는 뜻이며, 스스로를 탓할 이유는 없다. 전문가들은 배정남의 사례를 빗대 반려동물은 인간처럼 죽음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느끼는 죄책감·공포·불안이 과도하게 자신에게 향하지 않도록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