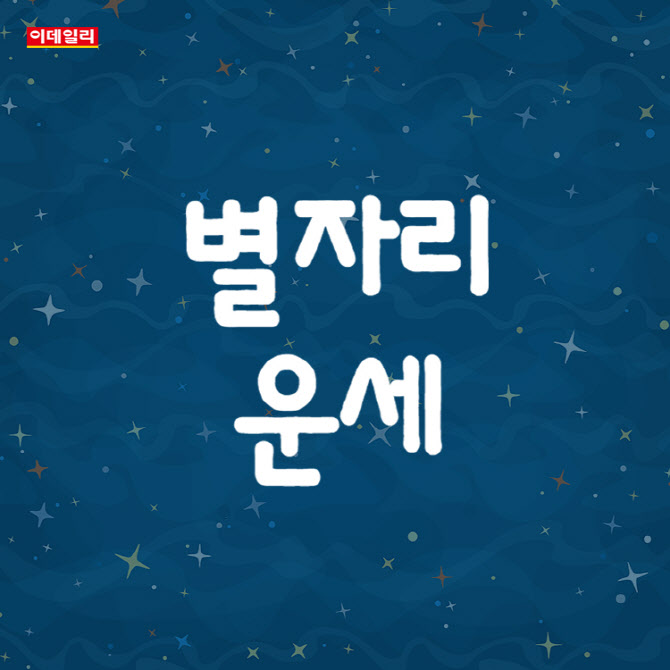신안골모퉁이의 가마솥삼계탕
초겨울 금산이 어떤 곳인지는 이동만으로도 감이 잡힌다. 시내에 들어서면 변화는 더 분명해진다. 길가에는 씻어놓은 인삼이 줄지어 놓여 있고 가게마다 인삼을 다듬는 냄새와 소리가 이어진다. 금산이 인삼을 중심으로 살아온 도시라는 사실이 단번에 드러난다.
초겨울에 금산을 찾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 시기 인삼의 상태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기온이 내려가면 흙의 수분이 잡히고, 인삼 뿌리는 단단해진다. 금산 여행은 바로 이 시기, 이 풍경에서 시작된다.

금산 인삼주 체험
금산은 오랫동안 인삼의 고장을 넘어 ‘인삼의 기원지’를 자처해 왔다. 그 주장이 단순한 지역 자부심을 넘어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남이면 성곡리의 개삼터 공원은 금산 인삼 이야기가 출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개삼’(開蔘)은 글자 그대로 “삼을 연 곳”이다.
전설은 간단하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강 처사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진악산 굴에서 기도하던 중 산신령에게 삼을 받았고, 그 씨앗을 마을 밭에 심었다는 이야기다. 역사적 사실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이야기는 금산 사람들이 “인삼은 원래 우리 것”이라고 말해온 근거가 됐다.
그렇다고 인삼의 재배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넓지도 않고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지도 않다. 금산이 ‘인삼의 도시’가 된 건 근래의 일이다. 전국 인삼이 금산으로 모여 선별·가공·거래의 과정 전체가 이곳을 중심으로 흘러왔기 때문이다. 전국 인삼 유통량의 약 80%를 금산에서 다룬다. 이 지역에서 인삼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삶 그 자체다.
‘금산인삼관’은 금산 인삼의 생활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전시관은 수삼·홍삼·백삼·흑삼의 차이부터 토양·재배·가공·역사까지 과장 없이 차근차근 설명한다. 금산 사람들이 몸으로 익혀온 기술이 어떻게 문화가 되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금산인삼시장 매대에 쌓여져 있는 인삼
이곳에서 가장 놀랐던 건 인삼 가격이었다. 수삼 한 채(750g)가 대략 2만 5000원 선. 겉모양이 조금 부족해도 1만 7000원이면 살 수 있다. 여행지에서 제철 과일이나 수산물을 사는 것보다 부담이 없다.
금산 인삼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요즘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삼이 4년근이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6년근만 귀하게 여기는 시대는 지났다. 재배 기술이 발달하며 4년만 키워도 굵고 튼실한 인삼이 나온다. 사포닌 함량도 6년근과 큰 차이가 없다. 5년을 넘어가면 관리가 까다롭고 채산성도 떨어져 요즘 시장에는 4~5년근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인삼을 사는 일은 ‘건강을 사는 행위’로 느껴진다. 보통은 자신의 건강보다 챙겨야 할 가족이나 지인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 인삼에는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의미가 깃들어 있고 그걸 건네는 마음까지 함께 전해진다.

신안골모퉁이의 가마솥삼계탕
금산 음식은 인삼을 앞세우지 않는 방식으로 완성한다. 금산의 음식은 인삼을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 재료가 지닌 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조리한다. 그래서 금산 인삼 미식은 세게 오는 맛이 아니라 스며드는 맛에 가깝다.
‘신안골모퉁이’의 토종닭 인삼백숙은 그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가마솥에서는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지만 인삼 향은 과하게 나오지 않는다. 국물은 잔잔한 황톳빛을 띠고, 인삼의 은은한 향과 닭의 감칠맛이 한 숟가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인다. ‘뼛속까지 따뜻해지는 맛’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조무락’의 인삼정식은 인삼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한다. 생·절임·튀김·건조 형태의 인삼이 코스 요리처럼 등장한다. 생인삼채 샐러드, 오방색 인삼야채쌈, 흑삼조림 등 ‘많이 넣어서 맛이 진하다’가 아니라 ‘상태가 달라지며 향이 달라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성이다. 금산에서 인삼 요리를 가장 섬세하게 다루는 집으로 꼽히는 이유다.
‘적벽강가든’의 도리뱅뱅은 불향이 먼저 올라오고 이어지는 인삼어죽은 들깨 향에 인삼의 뉘앙스가 가볍게 겹친다. 두 음식의 온도와 질감이 다르지만 마지막엔 민물의 풍미와 인삼의 향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세지 않은 맛이 오래 남는 방식이다.

신안골모퉁이의 가마솥삼계탕
이번 여행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진행한 ‘K-미식 인삼벨트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일정이었다. 여섯 차례 진행한 당일치기 프로그램은 매번 조기 마감됐고, 그 이유는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었다. 가마솥 인삼백숙을 먹고, 인삼 꽃술을 맛보고, 민물고기와 함께 끓여낸 인삼어죽을 경험하고, 직접 인삼 캐기까지 해보니 ‘특산물이 여행의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가 분명해졌다.
물론 미식의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건 인삼의 확장 가능성이었다. 산지에서 재배한 인삼을 맛보고, 인삼을 사서 누군가에게 건넬 때는 여행의 경험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일’처럼 느껴졌다. 다른 특산물과 확연히 다른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금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들판에서 흔들리던 차광막이 문득 떠올랐다. 겉보기엔 별다를 것 없는 장면. 오히려 그 조용함이 금산의 초겨울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금산은 화려하지 않다. 대신 계절의 변화, 땅의 기운, 인삼을 다루는 사람들의 습관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천천히 스며든다. 이 도시가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인삼 때문이 아니라 인삼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방식 때문이다.
초겨울 금산은 여행을 화려하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여행자가 천천히 머물고, 뿌리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그 과정에서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만들어준다. 그게 금산 여행이 남긴 가장 정확한 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