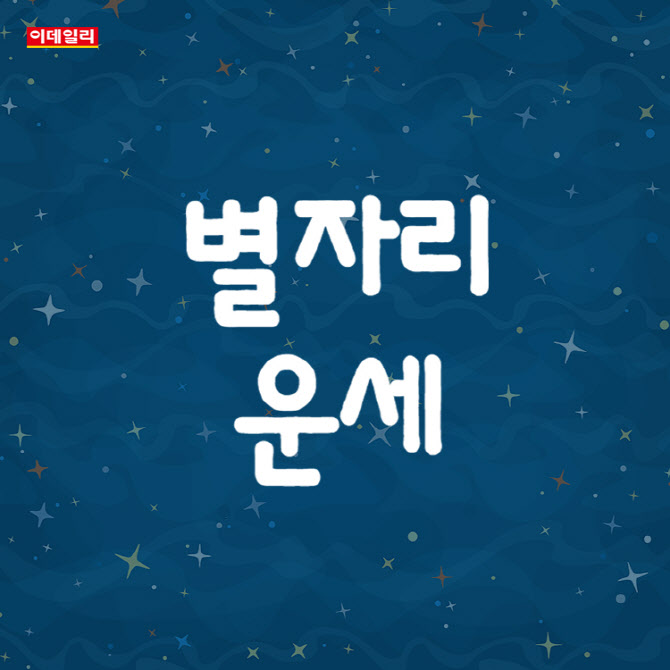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 문화체육관광 AI·디지털혁신 포럼’을 열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했다. 법·제도, 체육·관광, 예술·콘텐츠 등 3개 분야로 나눠 전문가들이 AI 기반 혁신의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5 문화체육관광 AI·디지털혁신 포럼’
김언호 하이로컬 이사는 “AI 통번역은 이미 현장에서 전문 통번역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소음과 억양이 섞인 상황에서도 정확도가 유지될 만큼 기술이 고도화됐다는 설명이다. 반복 안내와 정보 전달 같은 정형 업무는 자동화될 수 있으며, 예외 대응과 감정 조율 등 인간 고유의 역할만 남게 될 것이라는 진단도 이어졌다.
김명준 트립빌더 대표는 “AI는 쏠림을 강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분산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광 특화 sLLM 기반 ‘AI 여행비서’는 조건 한 줄만 입력해도 검색·비교·일정·예약을 통합해 보여주는 구조다. 혼잡 시간대와 이동 반경을 반영해 비혼잡 지역을 제시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어 과밀관광 대응 기술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장 운영에서도 변화는 빨랐다. 김언호 이사는 “사업 규모가 작아도 명확한 목적만 있으면 AI 도입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의 혁신바우처 사업에서도 중소 호텔의 다국어 택시 호출 서비스, 캠핑장의 장작 배달 로봇, 객실 어메니티 소비량 분석 등 실증 사례가 다수 소개됐다.

김석일 한국관광공사 차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5 문화체육관광 AI 및 디지털 혁신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담에서 좌장을 맡은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AI를 쓰는 기업과 쓰지 않는 기업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기존 직무 구조가 빠르게 재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화가 늘어날수록 직무 충돌과 고용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석일 한국관광공사 차장 또한 “중소규모 사업자도 AI를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며 “탐색이 아니라 적용 단계로 넘어가는 초기 전환기”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관광AI는 특정 기능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용자 경험과 운영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기술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햇다. 이들은 “기술은 이미 현장에 도착했다”면서 “ 남은 것은 이를 다루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산업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