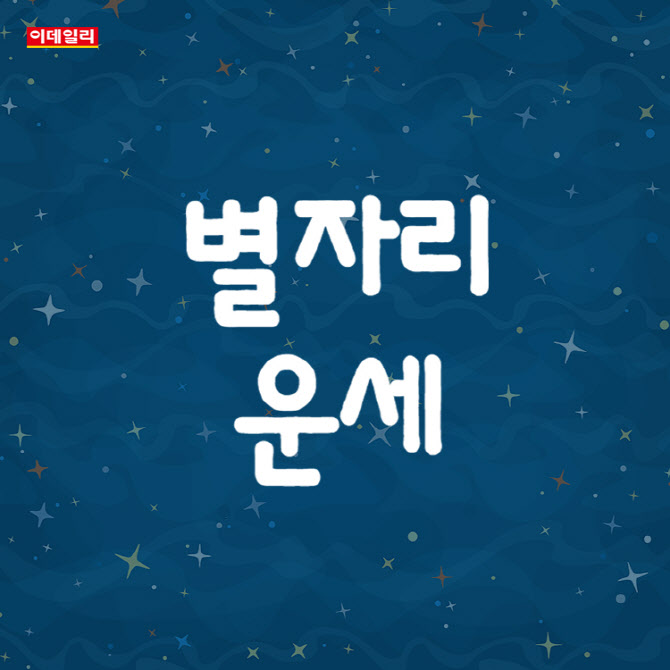연극 '야끼니꾸 드래곤' 공연 중 용길이 시청 직원을 향해 울분을 토하는 장면.(예술의전당 제공)
"산 넘어 산이라더니 언제쯤 내 인생, 활짝 꽃 필 날이 오려나." 막내아들은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한 뒤 실어증에 걸리고, 셋째 딸은 가수가 되겠다며 속을 뒤집더니 남자 문제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 폭탄 같은 일들이 예고 없이 터지는 게 인생이라지만, 이 집은 유독 바람 잘 날이 없다. 어머니 '고영순'(고수희 분)이 한숨 섞인 넋두리를 내뱉는 이유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선 연극 '야끼니꾸 드래곤'의 마지막 공연이 열렸다. 작품은 1970년대 일본 간사이 지방을 배경으로, 곱창집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재일 한국인 '용길' 가족의 삶을 그린다. 용길은 태평양전쟁에서 한쪽 팔을, 한국전쟁에선 아내를 잃고 영순과 재혼한 인물. 곱창집 이름 '야끼니꾸 드래곤'은 용길의 용(龍)을 따 지었다.
재일교포 극작가 정의신이 쓰고 연출한 이 작품은 2008년 초연 뒤 2011년 재공연을 거쳐 14년 만에 한국 무대로 돌아왔다. 초연 당시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한국연극협회 '2008 공연 베스트 7'에 선정됐다. 일본에서도 '아사히 무대예술상 대상', '요미우리연극대상 대상' 등을 받으며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무대는 재일 한국인이 마주해야 했던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둘째 사위 '테츠오'는 대학까지 나왔지만 재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유랑 인생'을 이어가고, 막내아들 '토키오'는 일본 사립학교에 진학했으나 따돌림과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지붕에서 몸을 던지고 만다.
작품의 클라이맥스는 시의 재개발 사업으로 동네가 강제 철거 위기에 몰린 순간에 찾아온다. 용길이 시청 직원을 향해 "땅을 빼앗으려면 내 팔을 돌려줘, 내 아들을 돌려줘, 우리도 인간이야!”라고 절규하는 장면이다. 평소 큰소리 한 번 내지 않던 그가 쏟아내는 울분이기에 관객에게 더 아프게 파고든다.

연극 '야끼니꾸 드래곤'의 마지막 장면(예술의전당 제공)
하지만 '야끼니꾸 드래곤'은 비극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곳곳에 유머와 온기가 스며 있다. 특히 곱창집 단골 3인방은 용길네 가족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작은 위안이 되어 준다.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동네지만, 이들 덕분에 이곳은 그 어떤 곳보다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이 된다.
이 같은 웃음과 눈물의 뒤섞임은 정의신이 말한 자신의 창작 철학과 닿아 있다. 그는 개막 전 기자간담회에서 "인생은 희극과 비극이라는 두 개의 레일 위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 그 레일이 뒤집히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삶의 현실을 작품 속에 녹여내려 한다"고 했다.
두 레일이 뒤엉키다 다다르는 마지막 장면은 공연의 백미다. 눈발처럼 흩날리는 벚꽃 아래, 새로운 삶을 향해 '돌진'하는 노부부의 모습은 관객 가슴에 오래도록 각인될 명장면이다. 커튼콜이 끝나고 객석에 불이 켜질 때까지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j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