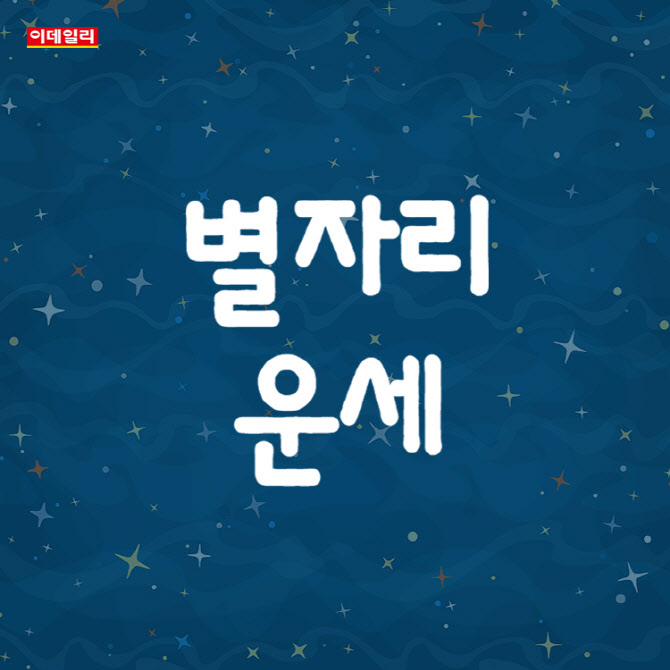파리 1919
세계적 역사학자 마거릿 맥밀런이 1919년 파리 강화회의의 첫 6개월을 따라가며 '패전·해체·신생'이 교차한 세계사의 현장을 복원했다.
'파리 1919'는 전쟁의 잔해 위에서 국제연맹·신생국·국경선·배상 체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오늘의 분쟁 지형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파리는 대전쟁의 막이 내리자 세계 정부·상고법원·의회가 뒤섞인 거대한 협상의 수도가 됐다. 회의는 공식적으로 1920년까지 이어졌지만, 첫 반년이 결정적이었다.
승전국의 수반 4인은 '4인 평의회'를 꾸려 세계 질서 재설계를 시도했고, 여성 참정·흑인 인권·노동 헌장·민족 독립·군축 등 각자의 대의로 모인 수많은 대변자가 파리의 회랑을 메웠다.
저자의 접근 방식은 분명하다. 개념이나 사후 평가보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노트·메모를 좇아 '그때의 현재시제'를 복원했다.
독일의 처벌과 배상, 국제연맹 창설, 위임통치와 신생국 문제, 오스트리아·헝가리·오스만 해체의 여진까지, 맥밀런은 '연표'가 아닌 '인물과 결정'의 드라마로 그려냈다.
파리의 권력은 막강했지만 전능하지 않았다. 철도·항만·연료가 모자란 현장은 파리의 합의를 거부했고, 민족자결은 '원칙'보다 '예외'가 많은 현실 앞에서 흔들렸다.
핵심 쟁점은 독일이었다. 프랑스의 안보 집착, 영국의 균형 본능, 미국의 이상주의가 충돌·타협하며 배상·안보·통제 조항이 빚어졌다.
동·중부유럽과 중동 서사는 오늘을 비춘다. 부정확한 지도, 중첩된 민족·종교 현실, 열강의 이해가 엉킨 채 국경은 자주 '탁상 위에서' 그어졌다.
팔레스타인·아나톨리아·발칸의 장면들은 민족자결의 한계와 위임통치의 역설을 드러내고, 훗날의 분쟁 불씨가 이때부터 지펴졌음을 확인시킨다.
한국 독자가 눈여겨볼 대목도 있다. 일본이 승전 5강의 일원으로 회담에 참여한 현실, 그리고 민족자결 담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빚은 허상이다.
3·1과 5·4의 맥락을 국제정치의 냉혹한 좌표 속에서 재독해하라는 역자의 촌평은 오늘의 국제 감각을 묻는다.
결과적으로 파리는 완전한 질서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국제연맹·국제노동기구 등 다자 질서의 씨앗, 신생국과 국경의 지도, 전범 처벌과 배상의 틀이 여기서 태어났다.
맥밀런은 '만약'의 유혹을 경계하며, 중재자들이 씨름했던 질문 "민족·종교의 열정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가, 전쟁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가 여전히 현재형이라고 상기시킨다.
△ 파리 1919/ 마거릿 맥밀런 지음·허승철 옮김/ 책과함께/ 5만 5000원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