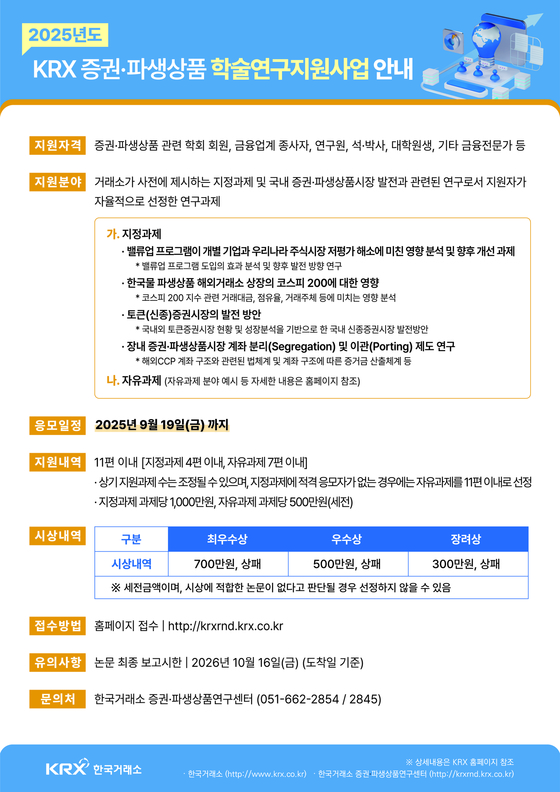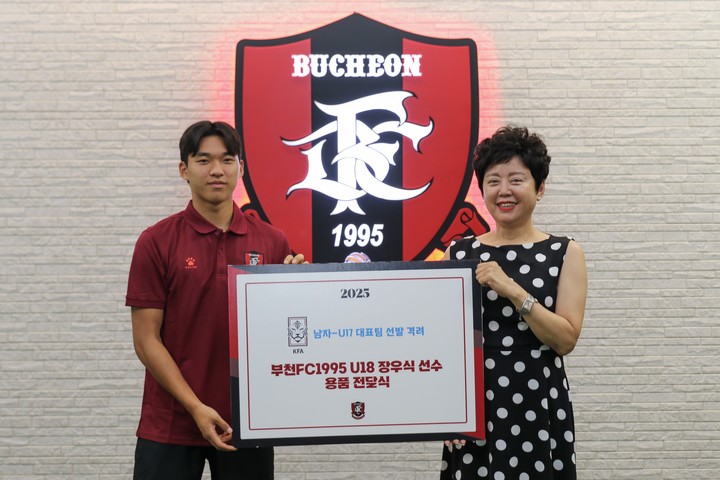잇단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저비용항공사(LCC)의 운항횟수는 원래 태생적으로 대형항공사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중·단거리 노선을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장거리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대형사보다 기체별 이착륙 횟수가 많다. 항공기 운항횟수가 많을수록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은 아니지만 LCC의 운항 피로도가 대형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사실이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출국 인파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사진=뉴스1)
이건 비단 항공업계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구조적인 문제다. 이직의 자유가 있는 데다 더 나은 처우를 향해 이동하는 것을 탓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은 항공 안전의 필수 인력인 만큼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회사가 크건 작건 항공 안전 필수 인력의 숙련도가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제도에만 기댈 수는 없다. LCC들도 안전이 항공업의 필수 조건일 뿐만 곧 ‘경영 실적’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LCC에선 준사고에 해당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누적되면 고객 사이에서 LCC 포비아가 형성되고 그다지 큰 가격 차이가 아니면 대형사를 이용한다는 게 최근 흐름이다.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이휘영 교수
최근 모 항공사 인력들의 익명 고발에서 보듯, 항공 업계 현장 목소리를 들어 보면 LCC 직원들 사이에선 처우에 대한 불만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다.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면 직무 충실도가 떨어지고, 대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에 이어 결국 항공 안전 문제로 귀결되게 돼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수익에 연연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생긴다. 이것이 안전 문제로까지 번지면, 그 회사는 결국 도태된다. 기업 스스로 직원 처우와 복리후생을 향상해 직무 충실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직 대형사만 보유 중인 ‘예비기’ 또한 중요하다. 최근 LCC들도 새 기체를 적극 도입 중이지만 아직 예비기를 두고 있는 곳은 없다. 이륙 전 문제가 생기면 대형사들은 예비기를 바로 투입하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LCC들도 최근 유럽, 미주 등 장거리 노선에 많이 취항했다. 항공기는 수많은 기계·전자 장비가 맞물려야 안전하게 돌아가는 교통수단이고 그만큼 예민하다. 항공사 스스로 예비기를 최소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대체할 예비기가 없다면 정비 스케줄도 타이트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게 누적되면 항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대형 사고로 직결될 위험을 언제든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LCC의 역사는 10년이 넘었고 우리 항공 산업은 태동기를 한참 지나 이제 안정기로 접어 들어가는 단계다. LCC도 여유기를 최소 한 두대 정도는 보유하는 게 맞다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