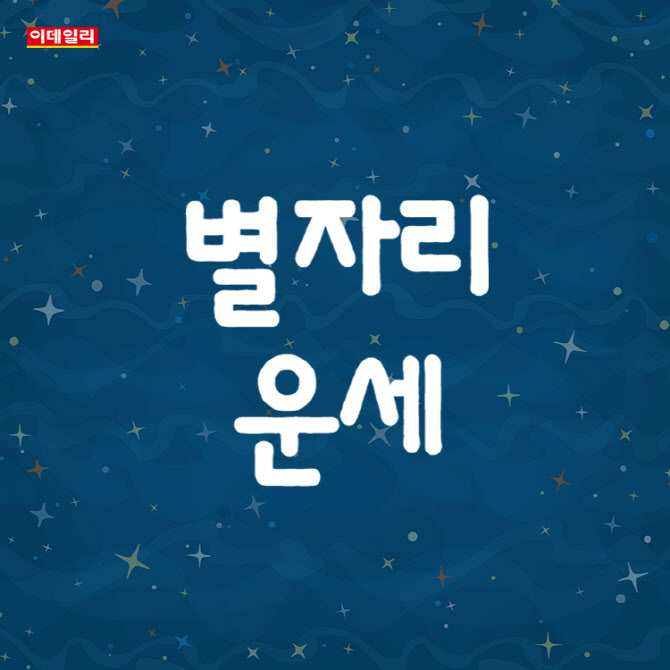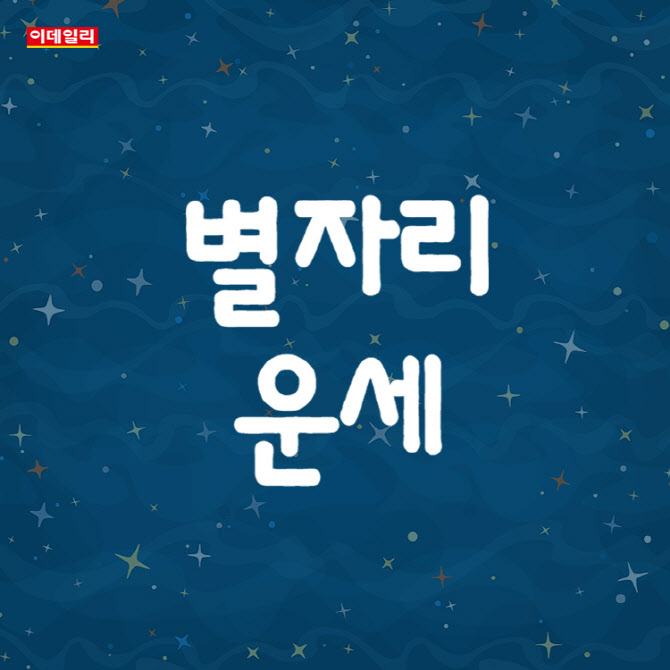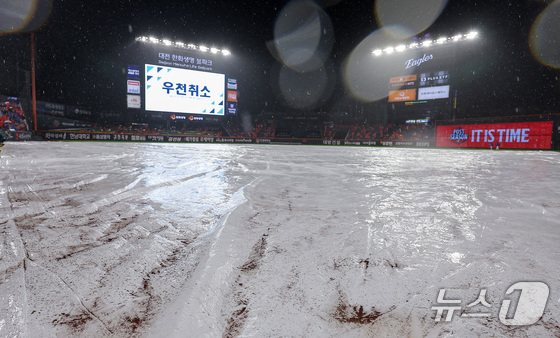"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1992년 덩샤오핑 전 중국 국가주석이 남순강화에서 남긴 한 마디가 30여년이 지나 현실이 됐다. 희토류는 미국과 무역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이 꺼내는 보복카드다. 효과 또한 만점이다.
중국은 '21세기의 석유'로 불리는희토류를 전 세계 시장에 약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부터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희토류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21세기 석유' 희토류가 뭐길래…곳곳에 있지만 채굴·정제 어려워
19일 업계에 따르면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희토류를 포함한 수출통제 조치를 6건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어떤 국가의 기업이라도 중국산 희토류를 극소량이라도 포함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미국이 14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당황한 미국은 5월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 역시 최근 미국이 입항세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자 나온 조치다.
희토류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17종의 금속 원소를 뜻한다. 이는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폰, 풍력발전기, 미사일 유도체계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다.
지구상에 널리 분포하지만 농도가 낮고, 추출·정제가 까다로운 데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 등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어 '희토'(稀土)로 불린다.
중국은 저가 생산 구조와 정제 기술을 앞세워 1990년대 이후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특히 희토류 관련 기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자국 내에 희토류 산업 공급망을 구축·발전시켰다는 분석이다.
반면 과거 세계 최대 상업 희토류 생산 광산이었던 미국의 마운틴패스 광산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환경 규제에 치이며 문을 닫게 됐다.
환경 비용 감수한 中, '보이지 않는 무기'로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 국면마다 희토류 수출 통제를 카드로 꺼내 들며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2023년에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했고, 지난해에는 안티모니, 최근에는 AI 서버와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고성능 모터·자석의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까지 통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 시각)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동맹이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호주·G7 등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0년 일본-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수출 금지를 경험한 일본도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여전히 정제·분리 단계에서의 중국 의존도가 70%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韓 '공급망 TF' 출범…기업도 희소금속 사업 강화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범부처가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국내 희토류 수입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내 비철금속 기업들에 오히려 기회라는 시선도 있다. 희소금속 제련 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 등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lyhighrom@news1.kr
'덩샤오핑 예언' 현실로…美 맞서는 中 최대 무기 '희토류'
경제
뉴스1,
2025년 10월 19일, 오전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