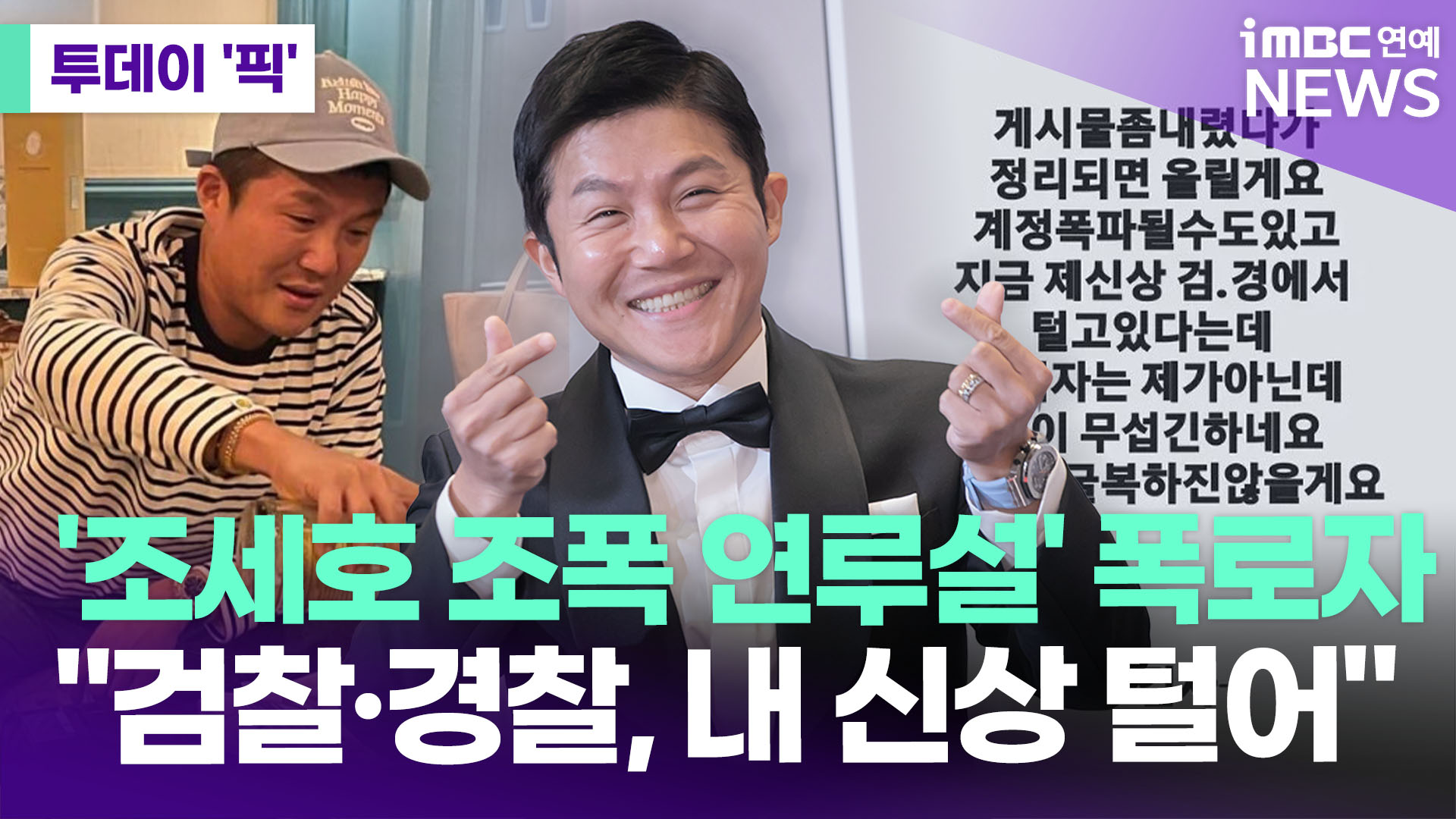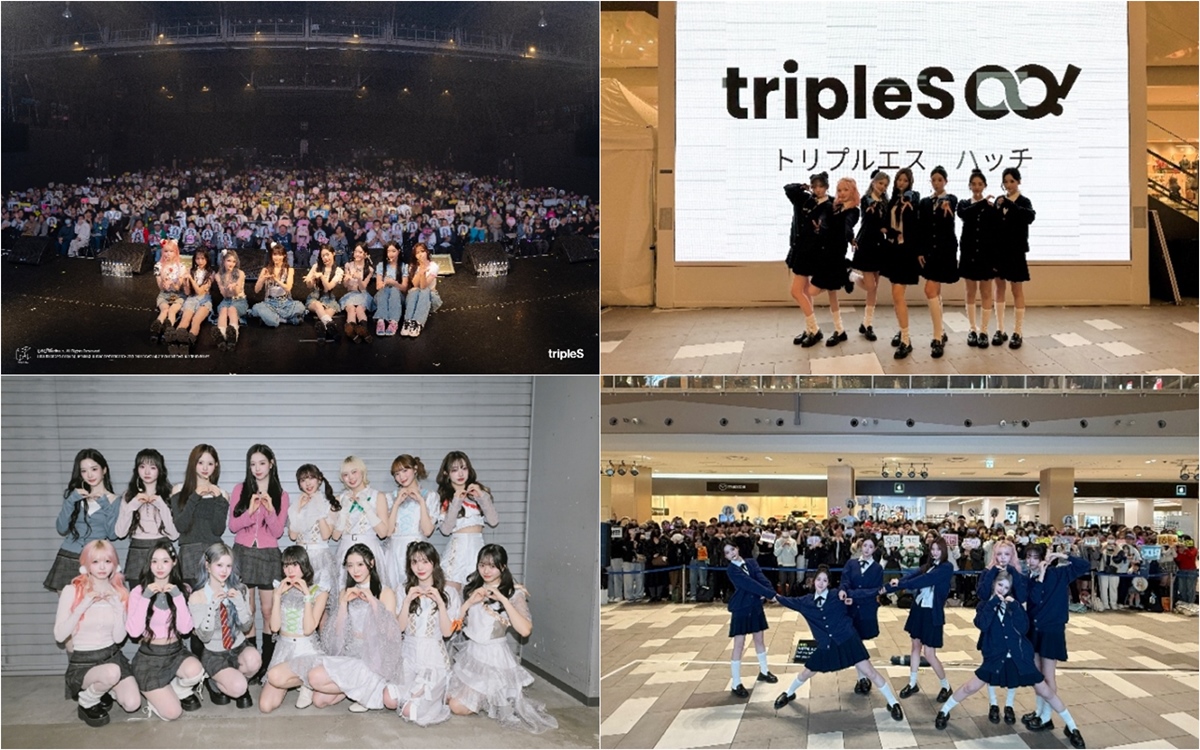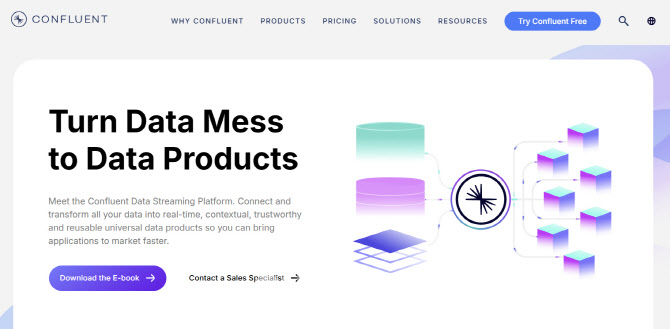이 고질적 악순환을 끊으려면 범퍼만 긁혔거나, 에어백도 터지지 않는 작은 사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실제로 영국이 경미한 목 상해에 대해 아예 ‘정액 배상’ 기준을 만들고 의학적 증거 없는 합의를 금지한 것은 참고할 만한 사례다. 작은 사고를 악용한 소액 청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미 사고 구간에서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다룰수록 오히려 큰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보상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미 사고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이 진짜 피해자를 더 온전히 보호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관건은 제도와 인식의 동시 개선이다. 법령에서 경미 사고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경미 사고 내에선 ‘인적 손해 없음’이 기본값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처럼 보험사가 ‘손해 없음’을 입증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손해를 입증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또 한방을 포함한 수가·심사 체계를 손봐 과잉 청구 유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다간 제도 전체가 흔들린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는 문제를 이제는 정면으로 다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