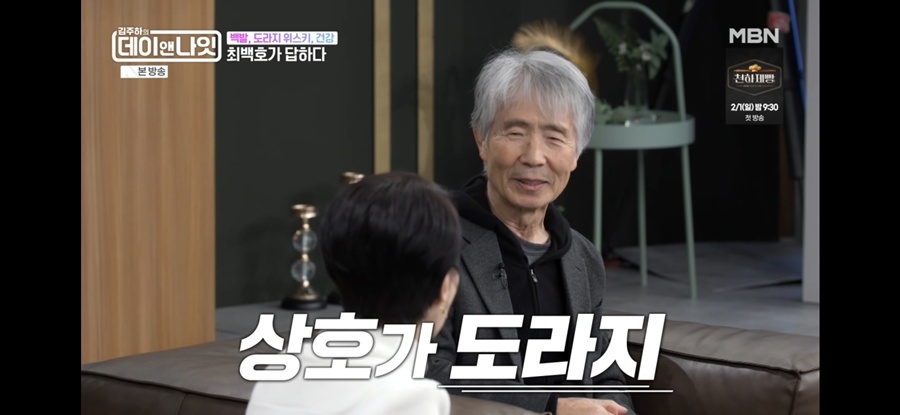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관건은 시장 획정 방식이다.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합산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기존에는 온라인쇼핑 전체 시장(259조원)을 기준으로 삼아 쿠팡 점유율은 13.9%에 그쳤다. 하지만 공정위가 직매입 등 물류·배송을 직접 통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자만 묶어 시장을 재획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으로 시장 규모는 90조원대, 쿠팡 점유율은 39%, 쿠팡·네이버(NAVER(035420))·신세계 3사 합산은 85%다.
네이버·신세계도 사실상 쿠팡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 셈이다. 이번 심의는 쿠팡 끼워팔기 혐의만 다루지만 이 기준이 선례가 되면 향후 다른 플랫폼 사건에도 충분히 적용될 소지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온플법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쿠팡 사태로 입법 요구에 다시 불이 붙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온플법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온플법은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입점업체 판매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등 관련 법안들도 여론의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온플법이 통과되면 네이버, 배달의민족, G마켓, 11번가 등 일정 규모 이상 국내 플랫폼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경쟁사 입장에서도 규제 일변도 흐름이 마냥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쿠팡이 타깃이지만, 언제든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쿠팡 와우멤버십이 끼워팔기로 제재를 받을 경우, 유사한 구조의 다른 구독 모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플랫폼 업계에서는 유료 멤버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OTT·배달·쇼핑 혜택을 묶는 결합 상품이 잇따르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다양한 혜택을 묶어 제공하고 있고, 배달의민족도 배민클럽에 OTT 등을 결합해 운영 중이다.
업계가 더 우려하는 건 규제의 역차별 가능성이다. 온플법 등 규제가 본격화되면 쿠팡·네이버 등 K플랫폼은 족쇄를 차게 되지만, 최근 국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같은 해외 플랫폼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들은 국내 매출을 공시하지 않아 규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기 어렵고, 해외 기업이라 실질적 제재도 쉽지 않다. 결국 쿠팡 잡으려고 만든 규제가 K플랫폼만 옥죄고, C커머스는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 거래는 이미 국경을 넘는 구조인 만큼, 국내 플랫폼에만 규제가 집중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독주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해하지만, 정밀한 시장 분석 없이 규제부터 쏟아내는 방식은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로 1위를 누르기보다 경쟁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