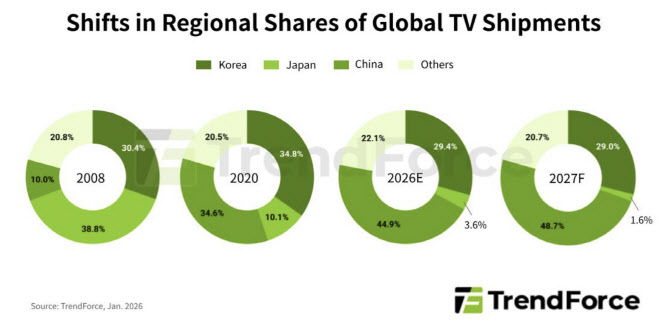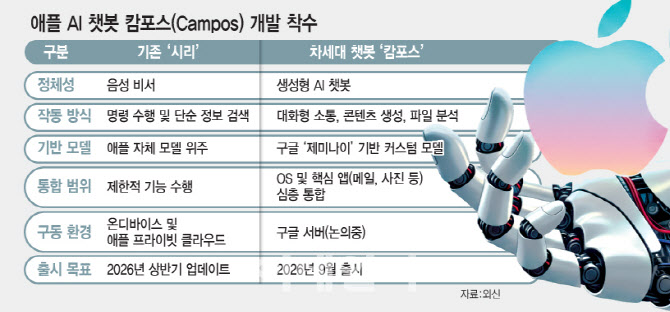리튬 배터리 생산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가격 반등을 이끈 직접적인 요인은 ESS 수요다.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함께 전력 저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와 별도로 ESS용 배터리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ESS에 주로 쓰이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역시 리튬을 핵심 소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ESS 발주 증가가 리튬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튬 가격 반등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구조에서 갈린다. 배터리 기업들은 주요 광물 가격 변동을 일정 부분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판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 상승이 즉각적인 마진 훼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과거 고가에 확보한 원료로 생산한 배터리를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했던 역래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실제 손익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계약 조정 시점과 수요 환경에 따라 판가 반영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ESS 수요 확대가 전기차 시장 부진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여전히 EV 수요 회복을 실적 개선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셀 업체들도 ESS를 중장기 성장 축으로 보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ESS 수요 확대만으로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캐즘 국면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ESS는 수요 보완 역할에 가깝다는 것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리튬 가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단기 급등과 조정을 반복해 왔다”며 “원자재 가격과 판가가 연동되는 구조상 단기 손익 영향은 제한적이고, 실적 개선 여부는 결국 EV 수요 회복이 동반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