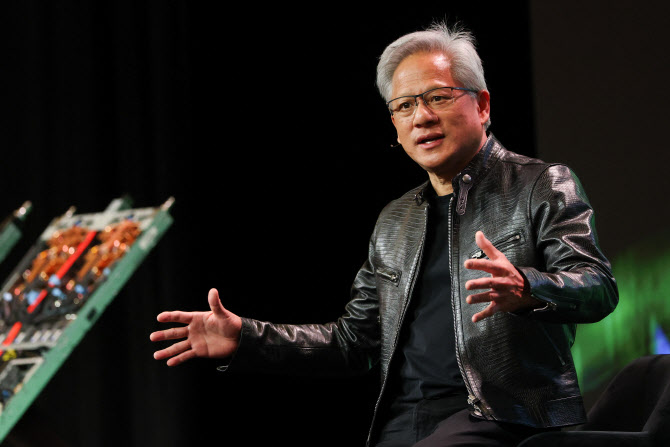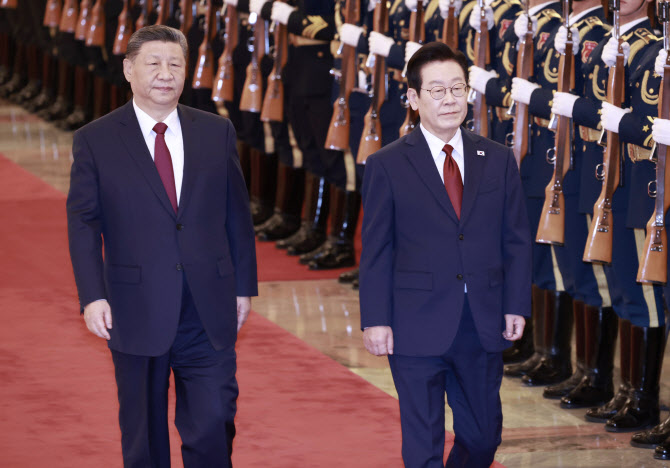종묘(사진=국가유산청 홈페이지)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온전한 유교 왕실 종묘’로서 물질적·비물질적 문화유산이 함께 보존된 드문 사례다. 특히 조선왕조의 정치·의례·공간 질서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건축·의식 복합체라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오늘날까지 계승·실연하고 있으며 제의·음악·무용이 함께 결합한 살아 있는 의례 체계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이 한 장소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점이 종묘의 중요한 세계유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종묘는 단순한 유적이 아니다. 조선의 예와 질서를 품고 세월의 층위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 건축 정신의 근본이자 시간의 기억 그 자체다. 도심의 소음과 속도 속에서도 종묘는 여전히 느림의 언어로 존재한다. 긴 어도 위를 스치는 바람, 닳은 돌 계단의 흔적, 제례의 북소리와 이어지는 고요한 울림은 살아 있는 역사의 숨결이다. 개발의 명목 아래 이 공기와 그림자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공동체의 시간 감각을 잃게 된다. 종묘의 보존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그 질서를 이어가는 일이다. 건축이란 형태가 아니라 관계의 예술이며 종묘는 그 관계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따라서 세운4구역 재개발은 단순한 도심 정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유산 종묘의 시간과 질서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서울시는 종묘 앞 녹지축을 조성하고 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겠다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건물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녹지생태도심’이라는 이름은 매력적이지만 그 그림자가 종묘의 처마선을 스치는 순간 이 계획은 근본적인 모순과 마주한다. 종묘는 조선의 정치와 예의 질서를 압축한 건축이며 돌과 목재, 빛과 그림자가 한 몸처럼 얽힌 공간이다. 그 고요함은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시간의 형태’다. 그러나 초고층의 스카이라인이 그 위를 가리면 세계의 질서는 망각되고 도시는 자기 시간의 감각을 잃는다.
세운상가 일대의 재개발은 수십 년간 지연돼 온 도시의 난제다. 낙후한 상가를 정비하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개발이 종묘의 경관을 침식해 정전 앞의 ‘하늘의 여백’을 빼앗는다면 이는 단순한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를 넘어선 문제가 된다. 세계유산이란 형태만의 보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계의 지속을 뜻하기 때문이다. 종묘는 도시 가운데 자리하지만 언제나 도시의 속도 밖에 존재했다. 그것은 물질적 공간이 아니라 ‘질서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도시는 변해야 하지만 모든 변화가 진보는 아니다. 종묘 앞 개발은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 어떤 ‘시간의 철학’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높이를 세우기 보다 질서를 세워야 한다. 종묘는 우리에게 그 균형의 감각을 가르친다. 도시의 성숙은 더 많은 빌딩이 아니라 더 깊은 존중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