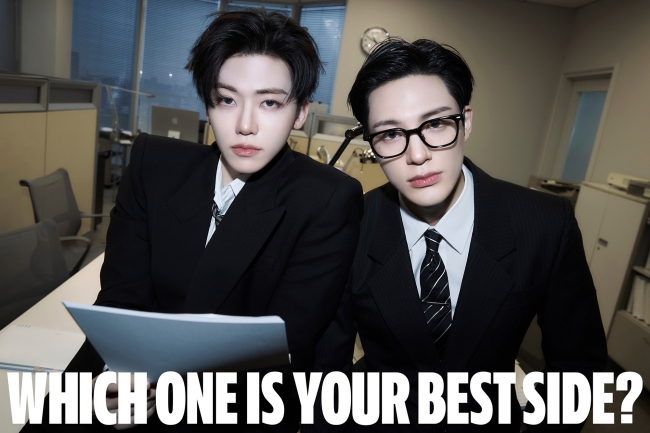정부가 1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당초 6000호에서 1만호로 4000호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사진=연합뉴스)
국제업무존에는 금융·컨벤션·호텔·문화시설이 집적되며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해 최대 1700%의 용적률과 100층 내외의 타워가 가능하다. 업무복합존은 정보통신기술(ICT)·연구개발(R&D)·오피스텔 중심으로 조성되며 인근 전자상가 및 현대자동차 R&D 센터와 입체보행통로로 연계된다. 쇠퇴한 산업 기반을 재생하고 직주근접형 도시로 확장하려는 구상이기도 하다. 업무지원존에는 교육·문화시설, 레지던스, 기업지원시설을 포함해 일 중심의 업무지구에서 생활 중심의 복합 생태계로의 전환을 꾀한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2030년대 초 입주를 목표로 한다. 약 14만 명의 고용창출과 30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되며 한강과 남산, 서울역을 잇는 입지 덕분에 도심·여의도·강남을 연결하는 3핵형 국제업무축의 중추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AI와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에너지·교통·시설 관리를 통합한 스마트 도시 운영체계를 실증하겠다는 ‘서울 스마트 코어’ 구상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비전의 이면에는 복합적 리스크가 자리한다. 초고층 복합개발은 인근 주거지의 젠트리피케이션, 교통 혼잡, 환경 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 공공임대 비율이 낮거나 재투자 체계가 불명확할 경우 개발 이익이 민간에 집중된 ‘그들만의 도시’로 변질될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코레일이 전체 부지의 70%를 보유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제한 방침과 1만 가구 주택공급 목표가 충돌할 경우 일정 지연과 구조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지의 소유권, 개발 주체, 정책 기조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어긋난 시계’가 현실화하는 순간 용산 프로젝트는 다시 불안정한 경로로 미끄러질 수 있다.
결국 성공의 관건은 ‘높은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정교한 거버넌스’다. 코레일·SH·서울시·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상설 통합사업위원회를 제도화해 토지·주택·업무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재무·공공성·도시성의 세 축이 균형을 이루는 조율 구조가 필요하다.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함께 작동하는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성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재정의해야 한다. 1만 가구 중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유지하고 상업·업무시설의 개발이익을 공원·문화시설·공공주택으로 환원하는 내부 교차보조 구조를 명문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의 투명성이다. 시민과 전문가가 계획 수립과 수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공개 워크숍을 제도화하고 공공기여 내역과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과거처럼 비공개 협의 속에서 조감도와 용적률이 바뀌는 일이 반복된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또 한 번 ‘그림의 도시’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 용산이 진정한 ‘서울의 심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도시의 욕망을 견디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정치적 결단과 행정의 실행력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