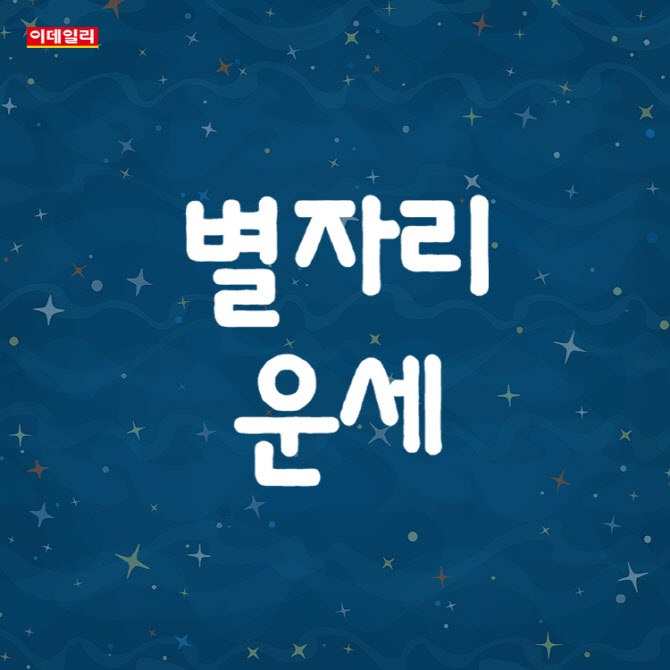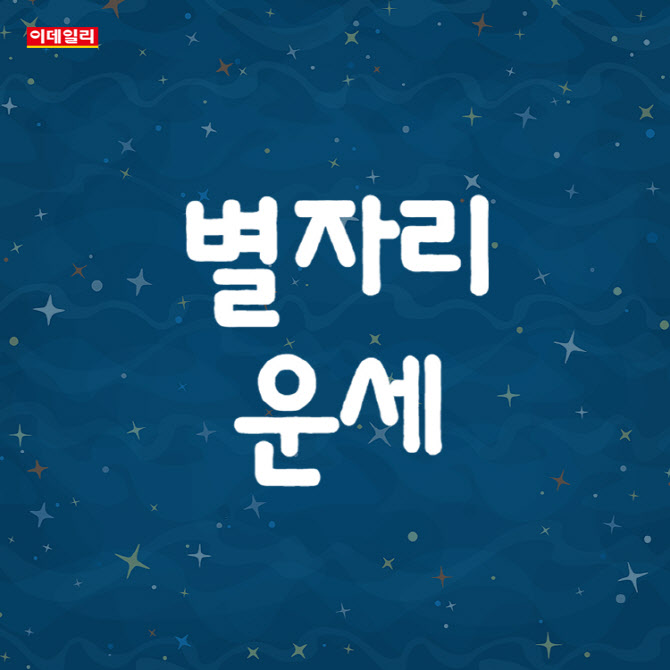연세대·고려대에 이어 최근 서울대에서도 챗GPT 사용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학생과 교수 모두가 제출 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생성 AI 탐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무하유는 14일 “올해 10월 GPT킬러 검사량이 전년 대비 3.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학기 중간고사 기간 동안 학생 자가검증용 ‘카피킬러 캠퍼스’와 교수용 ‘CK브릿지’ 모두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무하유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0월 17만7000건이던 학생 자가검증 문서는 올해 64만7000건으로 약 3.6배 늘었다. 제출 전 스스로 AI 활용 여부를 점검하는 ‘자가검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수용 CK브릿지 검사량도 10만1000건에서 43만7000건으로 4.3배 증가했다. 수업별 AI 활용 허용 범위가 달라지면서 교수자들이 직접 검증 도구 사용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표절률도 자가검증을 거치며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카피킬러 캠퍼스 검사 문서 중 표절률 50% 이상 문서가 40%에 달했지만, 실제 제출 시스템에서는 동일 구간이 20.6%에 그쳤다.
서울대서도 AI 부정행위 적발…대학가 충격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한 교양수업 대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시험 중 챗GPT에 접속해 문제를 푼 사실이 드러났다.
조교의 의심 신고로 시작된 조사에서 2명의 학생이 자진 신고했으며, 일부 학생의 추가 부정행위도 파악된 상태다.
해당 교수는 시험을 전면 무효 처리하고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세대·고려대에 이어 서울대까지 AI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학가에선 “어디까지 AI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커지고 있다.
“AI 무조건 금지보다, 출처 기반 가이드라인 필요”
무하유 신동호 대표는 “GPT킬러는 부정행위 색출을 넘어 학생 스스로 사고·표현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사용을 일괄 금지하는 것보다, AI 도움받은 부분 명시, 학생 고유 기여 구분, 윤리·출처 기준 마련 등 투명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AI 활용을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 구술평가·면접형 평가 등 ‘AI 대체 불가능한’ 평가방식 확대도 제안했다.
AI 시대, 대학 평가 기준 대전환 필요
AI 부정행위는 더 이상 비대면 과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대 사례처럼 대면 시험에서도 AI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평가 체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서 “AI를 어떻게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용할 것인가”로 논의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GPT킬러 이용 급증 역시 이러한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