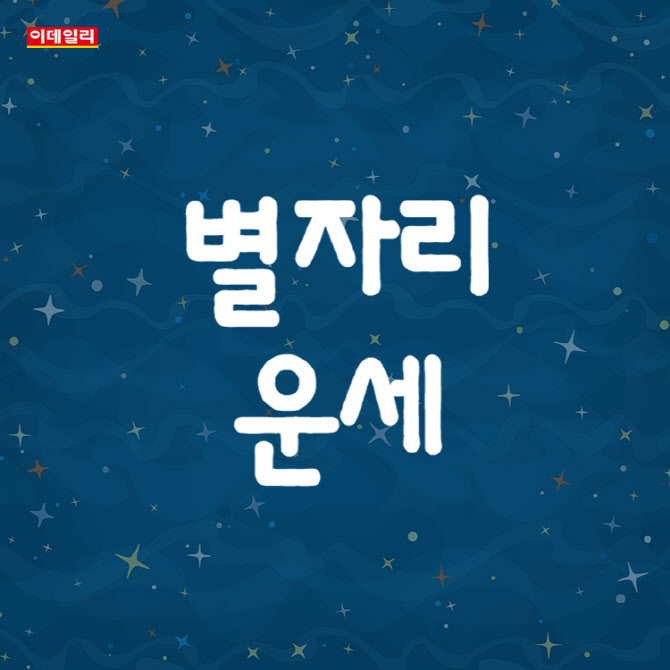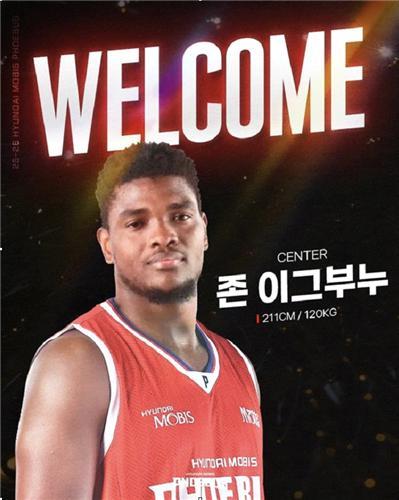SKT는 26일 삼성전자와 6G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무선접속망(AI-RAN)’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양사가 지난 수년간 6G 백서를 통해 꾸준히 강조해 온 ‘AI 내재화(AI-Native)’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6G 이동통신 기술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AI-RAN) 공동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류탁기 SKT 네트워크기술담당(왼쪽)과 정진국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이 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KT)
이번 협력의 핵심인 ‘AI-랜’은 기지국 등 무선 접속망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하는 기술이다. 기존 통신망이 정해진 규칙대로 데이터를 나르는 ‘덤 파이프(Dumb Pipe)’였다면, 6G 시대의 통신망은 스스로 환경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두뇌’를 가진 인프라로 진화할 전망이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기로 한 △AI 기반 채널 추정 기술 △분산형 다중 안테나(MIMO) 기술 △AI 스케줄러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전파가 건물이나 장애물에 부딪혀 왜곡되는 환경에서도 AI가 신호 전달 경로를 미리 예측해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정할 수 있다. 또 SKT가 6G 백서에서 강조해 온 ‘텔코 엣지 AI’ 개념을 적용해 기지국 자체가 통신 기능뿐만 아니라 AI 연산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는 기지국 등 통신망 말단에 AI 추론 연산 기능을 결합해 데이터가 중앙 클라우드로 모두 전달되지 않고도 실시간 AI 처리를 가능케하는 기술이다.
류탁기 SKT 네트워크기술담당은 “AI와 무선통신의 융합은 6G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라며 이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헀다.
◇“완전자율주행, 메타버스 시대 6G 필수”
양사의 협력이 6G 상용화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5G 때보다 훨씬 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6G가 최대 1Tbps급 전송 속도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6G 시대는 △일상에서 몰입형 확장현실(XR),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도심항공교통(UAM)과 완전 자율주행 △초개인화된 AI 서비스 등이 구현될 수 있다.
현재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기는 연산 처리를 위해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거나 유선 연결이 필요했다. 하지만 6G AI-랜 환경에서는 기지국에서 AI 연산을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안경처럼 가벼운 디바이스로도 고화질 홀로그램 회의나 실시간 디지털 트윈 제어가 가능해진다. 복잡한 통신환경이 필요한 하늘을 나는 택시나 자율주행차도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주파수와 경로를 찾아 끊김 없는 연결을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초개인화된 AI 서비스도 매끄럽게 가능해진다. 통신망 자체가 AI 기능을 수행하므로, 별도의 고성능 서버를 거치지 않고도 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즉각적인 AI 통번역, 비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데이터가 중앙 데이터센터까지 가지 않고 처리되므로 보안성 또한 강화된다.
6G 상용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대표적인 두 가지 과제는 주파수와 전력 소모 문제다. 6G의 초광대역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수백 메가헤르츠(MHz)에서 수십 기가헤르츠(GHz)에 이르는 광대역 폭이 필요하다. 전파 도달 거리가 매우 짧은 테라헤르츠 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커버리지 기술 확보도 시급하다. 양사가 협력하기로 한 ‘분산형 MIMO’ 기술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 AI 연산과 고주파수 대역 활용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 소모를 수반한다. AI를 활용해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에는 기지국 전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하거나, 저전력 AI 반도체를 통신 장비에 탑재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6G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진국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은 “SKT와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핵심 AI-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며 “6G 상용화의 길을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