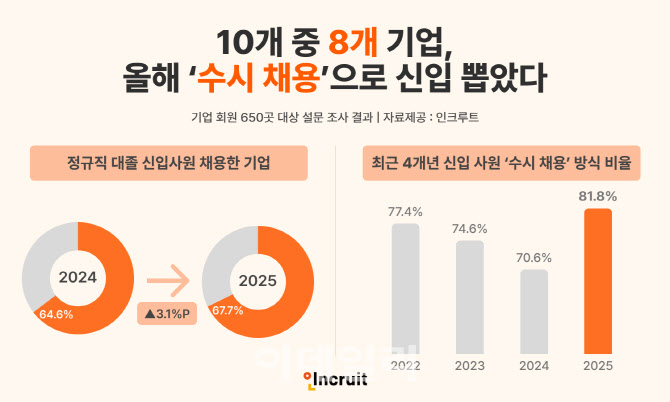그러나 성장으로 가는 물질적 기반, 다시 말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환경적 여건이 ‘공고’하게 갖춰졌다고 말하기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연구기반의 한축을 이루는 안전은 어디에도 없다.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연구실 안전사고는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39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사고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물론 악담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비가 늘면, 사고는 증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연구비가 첨단기술 실험실로 투입된다. 새로운 연구장비를 갖추고, 고강도의 에너지를 써서 새로운 화학물질과 새로운 바이오 합성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가 바라는 ‘과감한 도전’으로 ‘기술주도 성장’을 이루려면 말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의 연구환경 안전관리 시스템이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시스템 운영체계상으로나 거의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연구활동은 점점 첨단을 향해 달려가는데, 안전관리는 정체돼 있다는 점이 미래를 어둡게 한다.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중대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다. 공학 실험실 폭발로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했던 적도 있고, 연구자 50여 명이 실험과정에서 유출된 물질에 의해 집단 폐렴 증상을 보였던 적도 있다. 수십명이 실험실에 있다가 긴급히 대피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연구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화였으나, 오히려 연구현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로 외면받는다. 연구실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법이나 장비 확충을 위한 노력보다는 필수관리 요소에 대한 체크리스트만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 이슈는 언제나 큰 사고 직후에나 반짝 관심을 끌 뿐이다. 정부 관계자 조차도 이러한 현실에 난망해 한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형사고를 기다려야 하는가?
최근 해외외 과학기술정책 동향을 보면, EU를 중심으로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Responsible Research & Innovation, RRI)가 강조되고 있고, 세부 행동전략으로 안전한 연구개발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연구윤리 측면에서 안전한 연구환경 관리에 대한 지침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AI를 적극 도입해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안전’에는 연구자 건강위험과 환경위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투자로서 ‘안전’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모두 첨단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이 시기가 연구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혹 우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너무 정부관료 주도의 시스템이어서 첨단 연구가 이뤄지는 연구현장의 창발성과 유연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혹 ‘안전’을 강조하면서 연구자의 건강과 질병 위험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 건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는 모토의 실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돼야 한다.